입력2006.04.02 10:48
수정2006.04.02 10:50
은행 주총시즌이 되면서 '낙하산 인사'를 두고 말들이 많다.
연초가 되면 마치 무슨 연례행사나 되는 것처럼 반복되는 일이다.
하지만 올해는 낙하산을 타는 일이 그리 순조롭지 않은 모양이다.
지난달 신한은행 감사직 취업을 거부당한 금융감독원 국장급 간부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해치고 있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일찍부터 국민은행 감사로 내정됐던 금감원 이순철 부원장보도 국민은행쪽에서 또 한 사람을 공동 감사로 내세우는 등 반발하는 기미를 보이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은행장 문제도 거론되고 있지만 올해는 이처럼 특히 '감사'직이 문제인 것 같다.
업계와 금융당국에서 감사직에 대해 일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선 감사란 무엇인가 살펴보자.현행 증권거래법 1백91조는 '상장기업의 감사는 주주를 대신해 기업 경영진을 견제할 목적으로 최근 2년내 해당기업 임직원이 아니었던 사람 중에서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선출할 수 없다면 금융회사 감독의 전문성을 가진 금감원 간부들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의 제정 취지는 특정분야의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취업을 막아 '공평무사한 행정'을 보장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은행경영을 단지 감사만 하는 직책까지 법의 고리에 걸어 규제하는 것은 '법 과잉'일뿐이라는 지적이다.
금융회사에 취업할 때 최근 3년간 관련 업무를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박은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빼앗은 너무 경직된 규정이며,그래서야 누가 은행감독 등의 주요 보직을 맡으려 하겠느냐는 금감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은행은 금감원의 추천에 반발,공동 감사제를 제안함으로써 결국 낙하산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나름대로 감사제를 운영할 수 있는데 웬 낙하산이냐는 것.
취업을 제한하는 경직된 법과 현실,변하는 금융상황을 고려해 감사 관련 제도를 다시 논의해볼 만한 시점이다.
박수진 경제부 금융팀 기자 parksj@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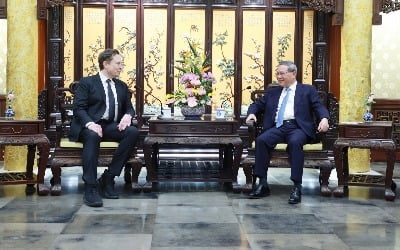

![끝 모르는 지정학적 위기에…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 [오늘의 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08322.3.jpg)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