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경영인] 이유림 <예도건축 대표>..팀제/아웃소싱 실천
대기업들이 요즘 앞다퉈 도입한다는 "신경영"이다.
그러나 예도건축의 이유림(37) 대표에게는 "신"이란 글자가 영 어색하다.
그녀에겐 이런 방식들이 5년전부터 시행해온 "구" 경영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대표는 "희귀종"으로 분류되는 일이 많았다.
대학(울산공대) 시절에는 건축학과 학생 40명중 홍일점이었다.
지금은 건축업계의 몇 안 되는 여성 건축사무소 대표다.
경영마인드를 가진 보기 드문 건축가란 점도 그렇다.
"무조건 덩치 키우기보다는 규모있게 꾸려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초기부터 기획, 감리, 업무보조 등 3개 팀으로 나눴죠. 1~2개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적정 인원만 유지했습니다."
프로젝트수가 늘어나 일감을 감당할 수 없으면 아웃소싱을 이용했다.
팀별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있으니 이들이 외주업체들을 관리하면 됐다.
급여도 본인과 협의해 능력만큼 정하는 연봉제로 했다.
그녀가 팀제를 이용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우선 팀별로 나누면 전문화되는 효과가 있다.
팀에 권한을 주다보니 직원들의 책임의식도 높아진다.
"책임질 수 있어야 일이 재밌다"는 게 이대표의 지론.
그녀는 이미지 스케칭(건축물의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일)정도만 직접
하고, 나머지 세세한 일은 직원들에게 맡긴다.
이런 식으로 늘 10명 안팎의 인원을 유지해갔다.
건축경기 침체 장기화로 건축사무소 폐쇄가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이대표가
버텨나가는 저력이 여기에 있다.
이대표는 일에 대한 열정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무기로 남자들 틈바구니
에서도 대학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졸업작품으로 제출한 "주거단지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작품으로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우수상을 탔다.
첫 직장인 일건건축에서는 "올림픽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현상공모"에 참여,
당선되기도 했다.
이어 89년에는 전쟁기념관 현상공모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졸업직후 입사한 일건건축에서는 현장근무를 자원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일도 험하고 갈등도 많은 현장에, 그것도 여성이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현장경험도 건축가로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게 건축사무소를 차리겠다는 마스터플랜 아래서 이뤄졌다.
93년 건축사 면허를 따자 그녀는 곧바로 건축사무소를 차린다.
"합격발표가 난 다음날부터 사무소 자리를 보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손꼽아 기다린 일이었다.
물론 접대문화가 여전한 건설분야에서 이대표가 살아남기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할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자"고
마음먹었다.
접대비는 설계나 공사비에 반영돼 부실을 낳고, 하자보수 등 말썽이 생기면
오히려 건축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꼴이 된다.
"건축주들도 꼼꼼히 집 지어주는게 가장 큰 이익이 된다는 걸 깨닫게
마련입니다"
덕분에 이 대표는 단골들도 꽤 생겼다.
그녀의 특기는"주거공간"의 설계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이 큰 힘을 발휘하는 분야.
예도건축에서 그동안 수행했던 15여개 프로젝트중 절반이상이 구리단독주택,
논현동및 심곡동 다가구주택 등 주거분야였다.
지난해에는 부산 사하구 구덕문화회관을 지어 사하건축상 우수상을 타기도
했다.
"멋진 실버타운을 지어보고 싶어요. 노인들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주거공간을
제공해 지어주는 것. 이것이 일반인들에게도 감성의 공간을 갖도록 해주고
싶다는 건축가로서 제 꿈이기도 합니다"
(02)568-6216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7일자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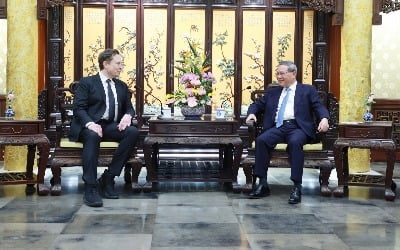

![끝 모르는 지정학적 위기에…고공행진하는 국제 유가 [오늘의 유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08322.3.jpg)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