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의 美 투자 '역대급'…"중국보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fDi마켓츠 데이터에 따르면 독일 기업들은 작년에 미국 프로젝트에 157억달러(약 21조원)의 자본 투자(M&A나 지분 투자는 제외)를 발표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82억달러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독일 기업들이 중국에서 투자를 약속한 금액은 총 59억달러에 불과했다. 또한 독일의 해외 그린필드형 투자 약정 금액 가운데 약 15%가 미국에서 발생했는데, 이 역시 전년도의 6%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한 종류인 그린필드형 투자는 현지에 공장이나 사업장을 새로 짓는 방식으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 독일 기업들의 미국 투자 붐은 20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됐다. 당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과 과학법(칩스법) 등을 제정해 청정 기술 제조업 분야와 반도체 산업에 총 7000억달러에 육박하는 세액 공제 및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한 원년이다. 독일 기업들이 지난해 미국에서 발표한 자본 프로젝트는 185개로, 이 중 73개가 제조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독일 화학기업 바스프도 미국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와 오하이오주의 석유화학 공장 증설 등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북미 지역에 총 37억유로(약 5조3000억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마이클 하인츠 바스프 북미지역 최고경영자(CEO)는 "시장 규모, 향후 10년간의 성장 전망, 정부 인센티브 프로그램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은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했다. FT는 "미국은 경제 성장세와 유리한 세제 혜택 등을 내세워 자국(독일) 시장뿐만 아니라 최대 무역 파트너인 중국의 경제 상황마저 악화해 고군분투 중인 독일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독일 기업들의 미국 투자 붐은 대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독일계 미국상공회의소가 지난 8일 발표한 미국 내 독일 기업의 자회사 224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6%가 2026년까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한 독일 상공회의소 대외무역 담당자는 같은날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늦어도 2025년까지 중국을 제치고 독일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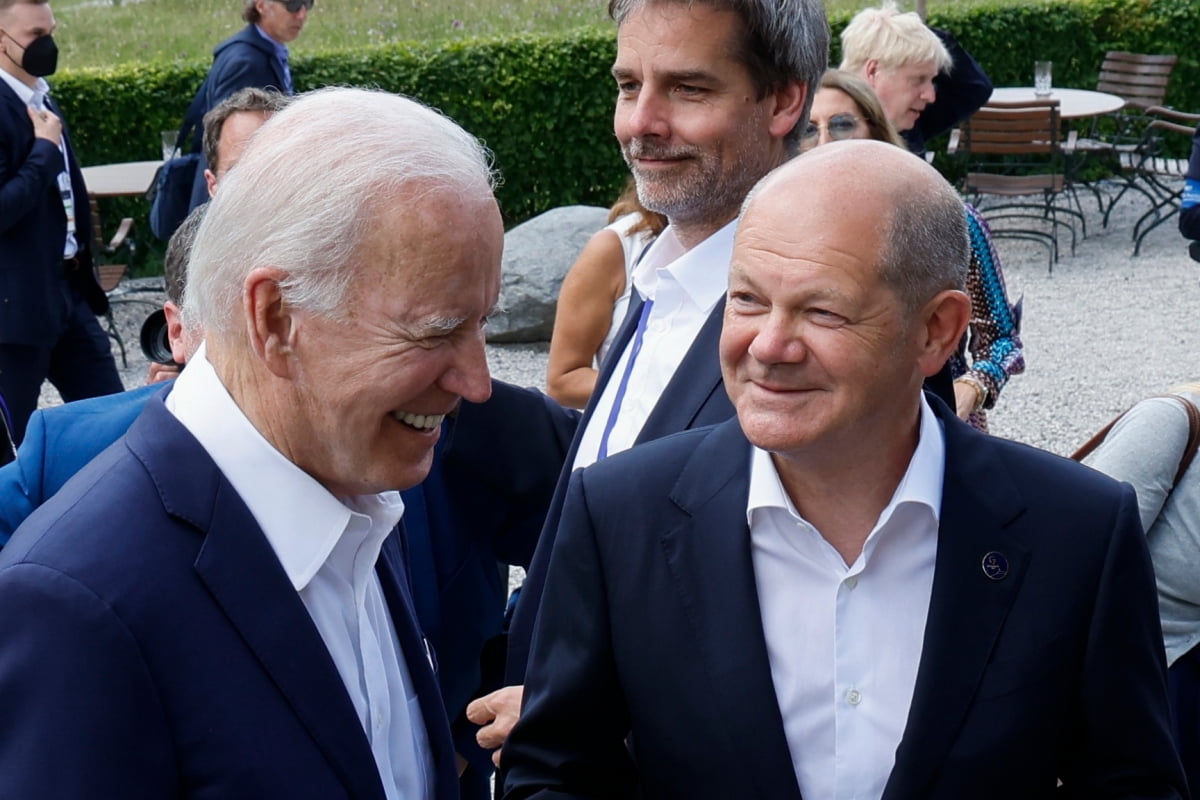
루트비히스하펜에 있는 본사를 영구적으로 축소하고 공장 폐쇄 계획을 밝혔던 바스프가 대표적이다. 작년 한 연구에서 독일 기업의 3분의1이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거나 확장하겠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한 응답률이었다. 바스프 북미지사의 하인츠 CEO는 "유럽은 과도한 규제, 매우 느린 관료 승인 절차, 값비싼 생산 요소 비용 등으로 인해 점점 더 기업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과 유럽이 기업 환경 측면에서 살아나려면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전기와 수소를 위한 적절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또한 관료주의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들며 역성장한 독일은 올해 1분기에도 경기 위축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날 분데스방크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과 운송 파업, 소비 및 산업 수요 약화 등으로 인해 1분기에도 경제가 역성장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발표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