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노조원 비율 10% '턱걸이'
23일(현지시간) 미 노동부의 연례 노조 현황 보고에 따르면 미국의 노조원 비율은 지난해 10%를 기록, 전년도(10.1%)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노동부가 집계를 시작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노조 가입률은 1950년대 30% 이상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꾸준히 떨어졌다. 지난해 민간 부문은 사상 최저 수준인 6%를 유지했고 정부 부문은 32.5%로 전년도(33.1%)보다 하락했다.
지난해 노조 조합원 수는 1440만 명으로 2년 연속 늘어났지만 전체 고용자 수 증가세는 따라가지 못했다. 흑인과 라틴계 근로자의 노조 가입자 수 및 비율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지만 백인과 아시아인 조합원 수는 줄었다.
지난해 자동차, 물류, 할리우드 작가 등 다양한 분야 근로자가 적극적인 단체 활동을 벌였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노동 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런데도 노조원 비율이 낮아진 것은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 임금 격차가 최근 빠르게 좁혀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노조원의 평균 주급은 비노조원보다 30% 이상 많았으나 작년에는 16%로 좁혀졌다. 2019년 이후 노조원 임금은 평균 15.3% 올랐는데 비노조 근로자 임금 상승률은 22.2%에 달했다. 로이터통신은 “노조에 가입해 임금 협상을 하는 것보다 이직하면서 임금이 상승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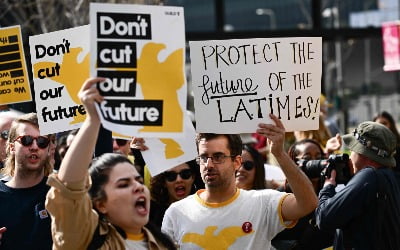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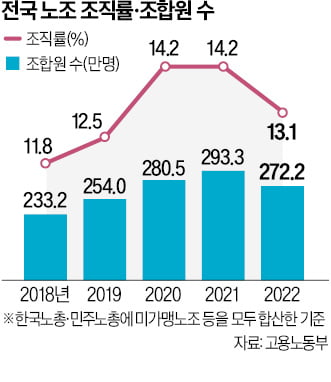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