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중국시장이 '한국병원의 무덤'?…진출 전략부터 제대로 짜라"
![[헬스케어] "중국시장이 '한국병원의 무덤'?…진출 전략부터 제대로 짜라"](https://img.hankyung.com/photo/201702/AA.13371543.1.jpg)
윤성민 아라메디컬그룹 대표(사진)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의료시장은 한국과 다르다”며 “두 나라 제도의 차이를 확실히 인식하고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표는 국내 의료기관의 개원 및 중국 진출 컨설팅 등을 맡고 있다. 중국 의료시장 사정에 밝아 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도 시장 분석 강의를 요청할 정도다.
2009년 정부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뒤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사업은 확대되고 있다. 초창기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에 뛰어든 의료기관들은 아픈 환자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 환율 국제정세 등에 따라 환자 숫자가 민감하게 바뀌었기 때문이다. 환자를 한국 병원과 이어주는 브로커 등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도 부담이었다. 이 때문에 상당수 병원이 해외에 직접 진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다. 일부 병원은 위탁운영 계약도 체결했다. 서울대병원, 우리들병원 등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진출했다.
하지만 성공 모델은 많지 않다. 특히 중국은 한국 의료기관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성공 모델을 찾기 어렵다. 윤 대표는 “한국 의료기관은 합자, 합작, 원내원 방식 등으로 중국에 나가고 있는데 지분 확보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 병원은 한국과 달리 투자 및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업과 같다”며 “한국 병원들이 이 같은 사실을 간과하고 진출한 뒤 손해를 보는 일이 많다”고 했다.
한국인이 중국에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반드시 중국인과 손을 잡아야 한다. 한국인이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인 동업자를 찾는 과정에서 손해 보는 계약을 하는 한국 병원이 많다는 게 윤 대표의 설명이다. 윤 대표는 “한국은 라이선스 있는 의사가 의료기관을 한 개 열지만 중국은 투자자가 병원을 개설한다”며 “지분을 준다는 것이 당장의 수익을 배분한다는 의미는 아닌데 이 둘을 혼동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인건비 문제도 지적했다. “한국 의사가 중국에 가면 진료, 상담, 수술 등 분야별로 세 명의 통역이 붙어야 한다”며 “의사 인건비도 한국에서보다 높게 줘야 하는데 여기에 통역비를 고려하면 인건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했다.
윤 대표는 성형외과, 치과 진료 등의 분야는 여전히 진료비가 높아 진출 기회가 열려 있는 분야로 꼽았다. 그는 “2025년까지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률의 60%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며 “사드(고도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이 있지만 발전속도가 느린 의료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지금이 기회”라고 설명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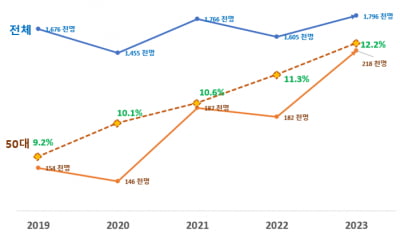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