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화처럼 만든 도자…흙이 전하는 감정과 이야기입니다"
도예가 이승희의 '평면 도자'

추상미술의 거장 고(故) 김환기 화백은 생전에 조선 백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 눈처럼 희고 깨끗한 백자가 자연의 빛과 물을 만나 빚어내는 아름다움을 예찬한 것이다.
서울 안국동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리는 ‘백자: 어떻게 흙에다가 체온을 넣었을까’ 전시에서 김 화백이 극찬한 백자를 볼 수 있다. 티끌 하나 없는 하얀 표면 위에 청색 유약으로 그려진 꽃잎이 조명 빛을 받아 반짝인다.
이 백자의 특이한 점은 ‘항아리’가 아니라는 것. 뭔가를 담을 수 있는 3차원의 입체적인 백자가 아니라 사각형의 평면 틀에 놓인 2차원의 백자다. 그렇다고 물감으로 그린 회화도 아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일반 백자와 똑같은 매끈한 표면이 고스란히 느껴진다. 도예가 이승희(64·사진)의 ‘평면 도자’다.
이 작가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하다. 2008년 ‘도자기의 도시’로 불리는 중국 징더전으로 건너간 뒤 줄곧 그곳에서 작품 활동을 해왔다. 내년에 중국 최대 명절인 국경절에 징더전에서 개인전을 열고, 2024년에는 미국 디트로이트의 한 대학 미술관에서 전시를 개최하는 등 벌써 전시 일정이 줄줄이 잡혀 있다. 지금도 일본 시가현립도예미술관의 초청으로 시가현에 머무르며 전시를 준비 중이다.
평면 도자는 그의 오랜 고민에서 탄생했다. “우리 세대만 해도 모두 서양미술에 심취했었죠. 동양미술은 관심 밖이었을 때 ‘한국적인 것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찾은 답은 아버지가 좋아했던 ‘조선 백자’였어요. 백자를 그냥 재현해서 만드는 건 평범하잖아요.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려면 뭔가 다른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자를 회화처럼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는 그렇게 나왔죠.”

이 작가에게 평면 도자는 ‘흙의 가능성을 넓혀주는 작품’이다. “도자 기법을 사용하긴 하지만 그릇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를 담는 쓰임새보다 더 중요한 게 흙이라는 재료를 통해 전달하는 감정과 이야기입니다. 관람객들이 제 작품을 통해 흙이 지닌 또 하나의 매력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가 평면 도자 외에도 도자로 만든 대나무, 사람 얼굴 모양의 도자기 등 새로운 작품을 끊임없이 제작하는 이유다. 서울공예박물관 전시는 내년 1월 29일까지.
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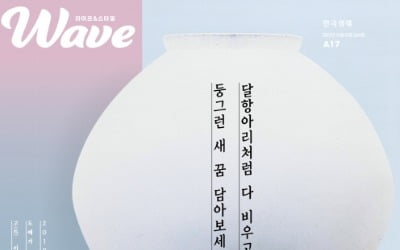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