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레 우려 과하다" vs "물가 심상찮다"
"고용없는 경기회복 단계
물가 상승 반짝효과 그칠 것"
vs
"美 천문학적 돈보따리 풀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커진다"
“물가가 오르고 있어 실질임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근로자는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추세적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다른 한편에선 중앙은행들이 살포한 유동성이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을 고려하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들은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퍼지면서 근로자·기업이 임금·제품값을 올리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 전 총재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나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박 전 총재는 “국제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오른 데다 경기가 개선되면서 일시적으로 물가가 뛰고 있다”며 “고용 없는 회복세가 완연해 인플레이션 우려는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인플레이션 논란의 칼자루는 중앙은행이 쥐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을 올해는 이어가겠지만 적절한 상황에서 유동성을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세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논쟁 자체가 섣부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44대 경제학회장)는 “코로나19 전개와 경기 흐름이 워낙 불확실하다”며 “경기가 살아나면서 수요가 늘고 물건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화할지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물가 오름세는 코로나19로 억눌린 소비가 다소 회복되면서 나타난 ‘반짝 효과’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인실 서강대 교수(49대 경제학회장)는 “가계소득이 줄어 씀씀이 증가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며 “소비가 늘어나면서 오름세를 보이는 물가가 우려할 만한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안 교수는 “2008~2014년 시장에 3조달러를 공급한 미국 중앙은행(Fed)이 코로나19 사태 직후에는 두 달 만에 3조달러를 쏟아냈다”며 “돈의 가치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앞으로의 기대 심리를 반영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근로자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려 인플레이션이 거세질 수 있다”고 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전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는 “1조9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경기 부양책 규모가 워낙 커 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며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올해 연간 3%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2000년대 들어 Fed가 푼 달러를 흡수하는 동시에 저렴한 물건을 미국에 공급해 인플레이션 압력을 눌러온 중국도 최근에는 임금이 뛰어 자체 생산한 물건을 내부에서 소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중국이 흡수하는 달러 규모가 줄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익환/노경목 기자 love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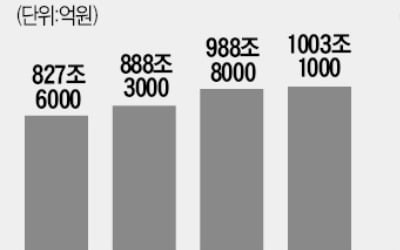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신간] 나무 내음을 맡는 열세 가지 방법](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3470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