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위험…암세포처럼 자란 '안전불감증'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잇따른 인재 멈추려면…신간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

1980년대 저금리·저유가·저달러의 '삼저호황'으로 부를 쌓은 한국은 1990년대 군부정권이 끝나고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발전 궤도에 올랐다.
정치와 경제가 순항하면서 대중문화도 꽃피웠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머지않아 보였다.
그러나 압축성장을 이뤄낸 '한강의 기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었다.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잇따라 무너졌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가 속출했다.
1993년 1월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로 29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부산 구포역에서 열차가 전복돼 78명이 숨졌다.
같은 해 6월에는 연천예비군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29명이 세상을 떠났다.
7월에는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추락해 66명이, 10월에는 서해훼리호 침몰로 292명이 각각 사망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7년 대한항공기 추락 등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1990년대는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의 시대'였다.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0년. 안전불감증에 빠졌던 대한민국은 많이 바뀌었을까.
성신여대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권오성 교수는 신간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21세기북스)에서 "끔찍했던 1990년대를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증거는 넘쳐난다.
올해 산업안전공단의 중대 재해 리포트만 살펴봐도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고, 전신주 접지선을 연결하다 떨어져 숨지는 등 거의 매일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피해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사고들의 위험성에 대해 언급한다.
이런 사고는 대형참사의 예고편 격이어서다.
저자가 인용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눈에 띄는 중대 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전조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큰 재난이 일어나기까지는 300여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물적 손실이 빚어지며 이것이 쌓여 하나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
저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등을 사례로 들며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성실하게 대응했다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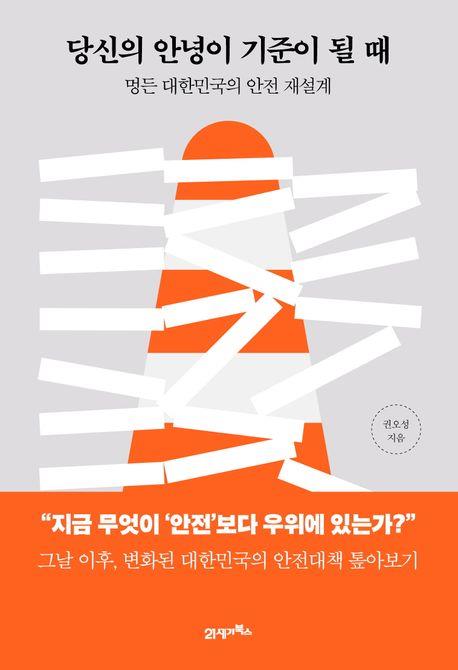
그렇다면 대형 참사가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가 관련 훈련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고를 예측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재화를 투자하기보다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관행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 성장, 효율성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중요한 안전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권은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며, 누구도 소외되어서도, 절대 침해당해서도 안 된다.
위험을 점검하고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
244쪽.
/연합뉴스

정치와 경제가 순항하면서 대중문화도 꽃피웠다.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이 머지않아 보였다.
그러나 압축성장을 이뤄낸 '한강의 기적'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암세포처럼 자라고 있었다.
허술하게 지어진 건물들이 잇따라 무너졌고, 안전 규칙을 지키지 않은 인재(人災)가 속출했다.
1993년 1월 청주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로 29명이 사망했다.
그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부산 구포역에서 열차가 전복돼 78명이 숨졌다.
같은 해 6월에는 연천예비군 훈련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 29명이 세상을 떠났다.
7월에는 아시아나항공 733편이 추락해 66명이, 10월에는 서해훼리호 침몰로 292명이 각각 사망했다.
94년 성수대교 붕괴와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 95년 삼풍백화점 붕괴, 97년 대한항공기 추락 등 대형 참사가 잇따랐다.
1990년대는 말 그대로 '안전불감증의 시대'였다.

성신여대에서 노동법을 가르치는 권오성 교수는 신간 '당신의 안녕이 기준이 될 때'(21세기북스)에서 "끔찍했던 1990년대를 지나고 수십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사실상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고 단언한다.
증거는 넘쳐난다.
올해 산업안전공단의 중대 재해 리포트만 살펴봐도 노동자들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고, 전신주 접지선을 연결하다 떨어져 숨지는 등 거의 매일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사고는 대형참사의 예고편 격이어서다.
저자가 인용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 눈에 띄는 중대 재해는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전조 없이 발생하지 않는다.
큰 재난이 일어나기까지는 300여건의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고, 29번의 인적·물적 손실이 빚어지며 이것이 쌓여 하나의 큰 사고로 이어진다.
저자는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구의역 김군 사망 사고' 등을 사례로 들며 작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성실하게 대응했다면 인명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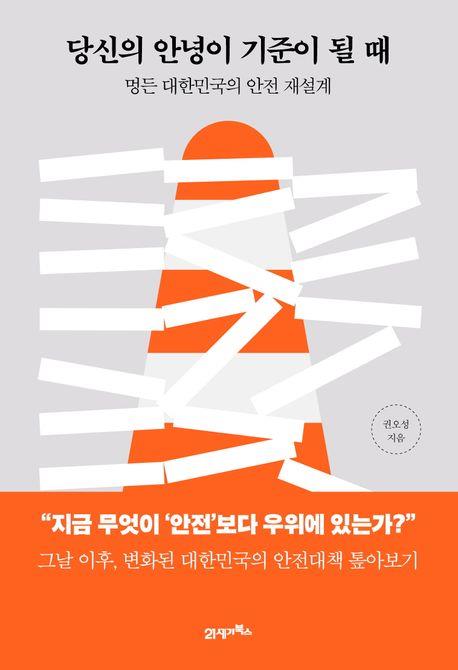
우선, 효과적인 비상 대응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데다가 관련 훈련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사고를 예측하고 면밀히 검토하면서 재화를 투자하기보다는 산업재해 발생 이후에 처리 비용을 부담하는 기업들의 관행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 성장, 효율성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면 앞으로는 그에 못지않은 수준으로 중요한 안전에 더 큰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재난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걸맞은 책임을 묻고, 온당하게 구제하는 일련의 '안전 최우선 사회구조 만들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의 안전권은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며, 누구도 소외되어서도, 절대 침해당해서도 안 된다.
위험을 점검하고 규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
244쪽.
/연합뉴스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