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성 규제완화 쉽지 않다"…금융당국, 은행 요청 고심
은행 '유동성비율 준수' 부담 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은행권이 최근 건의한 순안정자금조달비용(NSFR)과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완화는 국제 기준이어서 섣불리 수용하기 어렵다”며 “잘못 건드렸다가 자칫 한국 금융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인상만 줄 수 있어 대외신인도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NSFR은 은행이 1년 내 이탈할 수 있는 부채 규모를 충족할 만큼 장기 조달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지표다. 국제결제은행(BIS)은 10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NSFR이 중장기 규제라면 LCR은 30일간 순현금유출액 대비 예금과 국공채 등 유동자산의 비율을 뜻하는 단기 건전성 규제다. 주요 은행은 지난주 금융당국에 유동성 공급 확대 등 정부 차원의 자금시장 대책에 협력하는 대신 NSFR·LCR 등 건전성 규제를 추가로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구축 효과에 따른 자금시장 경색을 막기 위해 은행권에 은행채 발행 자제를 당부했다. 이어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연 5%대까지 끌어올리며 2금융권의 유동성이 마르자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이처럼 자금 조달 길이 막혔지만 은행이 돈 쓸 일은 오히려 많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 측에 회사채 매입과 기업 대출을 늘려 ‘돈맥경화’ 현상을 푸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주문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결국 자금 조달 없이 보유 자금만으로 유동성 공급을 늘리라는 얘긴데 그러려면 건전성 규제 비율을 완화하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NSFR은 103~109% 수준으로 권고치(100%)를 소폭 웃돌고 있는데 이 규제 부담을 덜어달라는 얘기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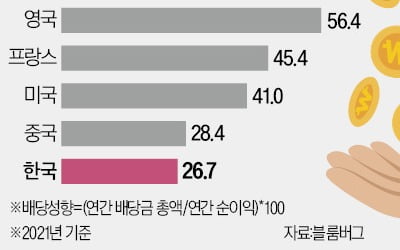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