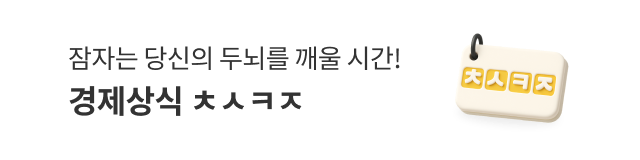이후 마차 택시는 디자인이 진화했다. 1834년 영국의 고딕 건축가였던 조지프 한솜이 ‘한솜 캡’을 고안해 영국과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 기존 네 바퀴를 두 바퀴로 줄인 게 핵심이다. 바퀴를 줄이자 속도가 빨라졌고, 말도 한 마리만 걸어 경량화를 이뤄냈다. 대신 비용은 ‘두 마리 네 바퀴’ 마차 택시에 비해 저렴했고, 말의 방향 전환도 쉽게 이뤄져 이동 시간이 줄었다.
이후 마차는 기계식 자동차로 대체되며 19세기 후반 전기 배터리로 구동하는 택시가 주목을 끌었다. 월터 C 버시가 1897년 9월 런던에 첫선을 보인 전기 택시는 여러 대가 운행되며 ‘윙윙 소리를 내는 새’라는 의미의 허밍버드라는 별명을 얻었다. 같은 해 미국 뉴욕에선 사무엘 전기 택시회사가 12대로 영업을 시작했고, 1898년까지 62대로 운영을 늘렸다. 물론 전기 택시는 내연기관에 자리를 내줬지만 이후 택시는 나라별로 필요에 따라 제도가 만들어지며 자동차 역사와 궤를 함께해왔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동 수단 기술은 발전했지만 운전자(마부)가 누군가를 태우고 이동한 대가(요금)를 받는 본질은 그대로 유지됐다.
그런데 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새로운 고민이 등장했다. 자가용이 넘쳐나 택시의 절대적인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택시가 존재한 이유는 국가의 면허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통제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요금, 디자인, 서비스 개선 등에 일일이 개입해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만든다는 목표가 분명했다. 그럼에도 넘쳐나는 자가용이 도로를 더욱 혼잡하게 하자 이를 줄이기 위해 자가용을 일시적 택시로 사용토록 하는 승차공유, 즉 카풀을 시행했다. 하지만 면허제를 유지하기 위해 운행 시간은 출퇴근에 한정했고 큰 문제 없이 공존해 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가용 보급은 더욱 늘었고, ‘나 홀로 운전’도 증가하자 앱(응용프로그램)으로 출퇴근 카풀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기업이 생겨났다. 이들은 수익 확대를 위해 ‘출퇴근 시간’ 개념을 다시 정의하자고 주장했지만 택시는 그럴 수 없다고 맞섰다. 이른바 전통적 의미의 카풀이 현대적 개념으로 전환된 것이고, 갈등은 커져만 가고 있다.

권용주 < 오토타임즈 편집장 soo4195@auto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