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불면증 등 동반되고 극단적 선택도
햇볕 많이 쬐고 우울증약 꺼리지 말아야
김진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40대 직장인 A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매년 계절을 타느라 이즈음이면 고생이 말이 아니다. 평소 업무 능력의 반도 발휘하지 못한다. 도통 집중이 되질 않아서다. 아마 밤새 잠을 설쳐서일 것이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낮 동안 멍하고 졸리기만 하다.
벌써 몇 해 지나다 보니 봄이 되면 기분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올해는 유별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증상은 나빠져 갔다. 처음엔 무기력한 정도였는데 점점 우울함이 깊어졌고 심지어 삶에 대한 의지마저 흔들렸다. ‘혹시 우울증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왠지 정신건강의학과를 가는 게 꺼림칙했지만 부부싸움을 하고도 상담받는다는 동료의 얘기를 듣고 용기를 내 병원을 찾은 것이다.
A씨는 ‘계절성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누구나 가을이 되면 기분이 다소 처질 수 있지만 모두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 않는다. 적어도 2주 이상, 거의 하루 종일 증상이 있을 때 우울증이라 한다. 여기서 증상이란 반드시 우울한 기분만 말하는 게 아니다. 한국 사람들의 우울증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가슴 답답함’이고 A씨처럼 집중력이나 기억력 등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주 흔한 증상이다. 원인을 밝힐 수 없는 통증, 불면증, 식욕장애, 소화불량 등의 신체적 증상이 동반하기도 한다.
A씨는 우울증치료제로 예상보다 신속히 호전됐다. 의욕도 생기고 기분도 밝아졌다. 무엇보다 회사에서의 업무능력이 정상이 돼 기뻤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루라도 더 빨리 치료를 받을 걸 그랬다는 A씨가 진료실을 나서며 얘기했다. “아직 가을도 안 지났는데 벌써 봄이 된 것 같아요!”
왜 가을이면 우울해질까? 일조량의 변화가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기분을 관장하는 세로토닌이란 신경전달물질이 있다. 소위 ‘행복물질’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은 햇볕을 받아야 분비가 왕성해진다. 가을이 돼 일조량이 떨어지면 세로토닌 합성이 줄어들어 우울한 기분을 만드는 것이다. 또 밤이 되면 우리 몸은 세로토닌을 이용해 멜라토닌을 합성하게 되는데 체내에 저장된 세로토닌이 감소하니 멜라토닌의 합성도 줄어들게 마련이다. 잘 알다시피 멜라토닌은 수면과 성행동을 관장하는 호르몬인데 이것이 모자라게 되면 불면증을 앓게 되기 쉽다.
그렇다면 햇볕을 많이 쬐면 우울함이 나아지지 않을까? 맞다. 심각한 우울증이 아니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 그리고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하루 30분 이상 산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계절성 우울증’ 예방법이다.
문제는 예방이 안 됐을 때다. 치료하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병이 우울증이다. 한국의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동의 1위다. 그것도 벌써 13년째다. 심리부검에 의하면 자살의 원인 중 80%가 우울증이라고 한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것이 OECD 통계에서 거꾸로 거의 1위인 것이 있는데 바로 우울증치료제 사용량이다. 다른 OECD 회원국 사용량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행복한 나라여서 우울증치료제 사용량이 낮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으나 자살률과 연관지어보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20년이 되면 인류를 가장 괴롭힐 질병으로 우울증을 꼽고 있다.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편견과 무지로 우울증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하루속히 정신과질환과 치료에 관한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앞으로 3년 후 지구상에서 우울증으로 가장 고통받는 나라가 되지 않으려면 말이다.
김진세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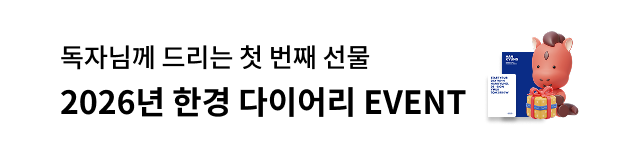
![[기고] AI 시대는 K반도체 도약의 기회](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AA.42713989.3.jpg)
![[한경에세이] 일이 안 풀릴 때 나는 달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42357927.3.jpg)
![[시론] 이상에 치우친 철강 탄소중립](https://img.hankyung.com/photo/202512/07.35475571.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