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줄 아셨습니까] 1인용 항암제 2명에게 투여, 병원 부당이득ㆍ건보재정 누수
▲사례2=지방의 J대학병원 암센터는 같은 종류의 암환자를 수명 또는 수십명씩 모아 특정한 날에 함께 주사맞게 하고 있다. 고가의 항암제를 최대한 아끼기 위해 치료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병원들의 '항암제 나눠 쓰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항암제는 통상 한 환자가 한 번 맞을 단위로 포장된다. 그런데 병원 측이 자투리가 남는다는 이유로 1인분을 환자 2명에게 투여한 뒤 건강보험료를 2인분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관행은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가 있기는 하다. 항암제는 다른 종류의 약물과 달리 체표면적(體表面積)을 기준으로 암 환자의 병세를 감안해 의사가 적정투여량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구가 크고 병세가 위중할수록 많은 양을 투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동양인의 체표면적은 남성이 1.62㎡,여성이 1.43㎡로 서구의 남녀 평균인 1.7∼1.8㎡보다 작아 서구인을 중심으로 설정한 소포장 용량을 쓰면 한국의 암환자에게는 일정량의 약이 남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병원에서 항암제 구입 개수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에 약값을 청구해 이득을 취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항암제 시장 규모는 연간 3936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다양한 용량의 항암제가 나오지 않는 한 '항암제 나누기'를 통해 병원들이 연간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기고,그만큼 건강보험재정이 누수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싼 항암제를 한 번만 쓰고 잉여분을 그냥 내버리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며 "게다가 항암제 시장을 장악한 다국적 제약사들은 판매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부러 소용량 포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다국적 제약사의 항암제 마케팅 담당 직원은 "이런 일이 의료계에서는 아주 흔한 편이며 부당이익을 챙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단적으로 말해 0.1인분의 항암제를 썼어도 1인분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는 건강보험의 항암제 급여기준의 허점을 병원들이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심지어 어떤 대학병원은 개봉한 주사약을 즉시 쓰지 않고 항암제를 냉장 또는 냉동보관했다가 투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럴 경우 약효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암환자 보호자는 "암환자들이 장기간의 투병생활로 경제사정이 나빠지게 마련"이라며 "사용하고 남은 항암제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투여해야지 병원들이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런 사안을 가지고 병원을 실사한 적이 없다"며 "적정용량을 위생적으로 투입한다면 규정을 어기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재정 측면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포토] 이재용 獨 자이스 본사 방문…반도체 공급망 직접 챙긴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52416.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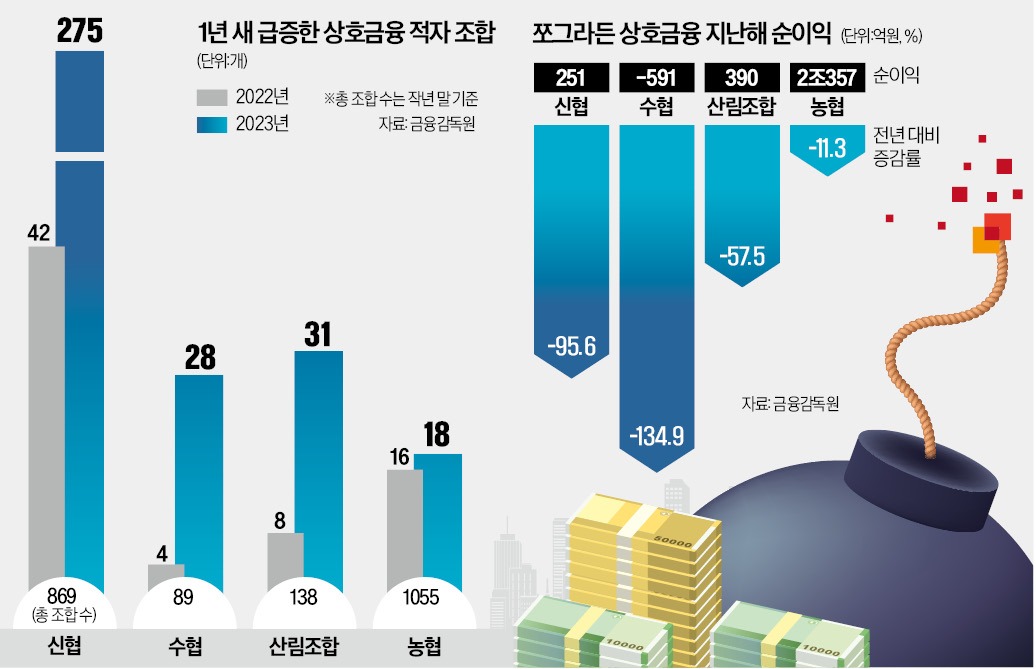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