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건 부시의 親기업정책 .. '경제관료 조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외 통상압력 강화, 강한 달러 포기, 친(親)기업 정책''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조각(組閣)으로 가늠해 본 경제정책의 방향은 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폴 오닐(65)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의 회장이다.
그는 포드 행정부시절 백악관 예산실에 근무했으며 영향력 있는 공공정책 연구소인 랜드코퍼레이션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7년 인터내셔널페이퍼에 부사장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후 20년 이상 민간기업에 몸담았기 때문에 기업인쪽에 가깝다.
부시정권의 초대 재무장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감세안 추진''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야 할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당으로 양분된 상원과 감세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감세안 관철까지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오닐 내정자는 그린스펀과 막역한 사이여서 이런 난국을 뚫고 감세안을 추진하는데 FRB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장관으로 확실시되는 돈 에번스(54) 공화당 선거본부장은 부시의 핵심 가신(家臣).
석유가스회사인 톰 브라운의 사장이기도 한 그는 부시 선거자금 1억달러 모금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8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앤드루 카드(52)는 부시행정부 시절 교통부장관, 백악관 비서실차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아버지 부시''의 사람.
93년부터 99년 초까지 미국 자동차업계의 간판 로비단체인 전미자동차제조업체연합(AAMA)의 회장을 지냈으며 이어 99년부터는 GM 부사장으로 재임했었다.
90년대 대부분을 미국 자동차업계 이익의 대변자로 활약하면서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 거센 개방압력을 넣었던 인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두가지다.
첫째 월가경험이 전혀 없는 제조업 경영자 또는 로비스트 출신이란 점이다.
따라서 미 기업들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해줄 만한 인물들이다.
둘째 이들은 하나같이 미 기업들의 수출확대 옹호론자들이다.
한국 등 미국의 무역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의 과거 8개 정권중 5개 정권이 월가출신 뱅커들을 재무장관직에 앉혔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은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다.
로렌스 서머스도 월가는 아니지만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런 관행에 비춰보면 재무-상무장관에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업계 인사를 앉힌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부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월가의 표정은 떨떠름하다.
경제브레인을 굴뚝산업 경영자들에게 빼앗겼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업계출신에게 경제정책을 맡겼으니 ''강한 달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요즘 미국 경기둔화나 주가급락의 핵심에는 ''기업들의 실적악화''가 자리잡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을 올려주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 달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달러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생겨 장사가 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강한달러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대변자들이 경제브레인이 되면 달러가치 하락을 방조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지 않겠느냐는 게 월가의 시각이다.
약한 달러는 미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다.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미 자본시장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클린턴 정부의 간판 경제브레인이었던 루빈과 서머스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 정책은 미국시장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으로, 인플레이션 예방약으로, 금리인상 억제제의 세가지 역할을 해왔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조각(組閣)으로 가늠해 본 경제정책의 방향은 이 세가지로 요약된다.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폴 오닐(65)은 세계 최대 알루미늄업체인 알코아의 회장이다.
그는 포드 행정부시절 백악관 예산실에 근무했으며 영향력 있는 공공정책 연구소인 랜드코퍼레이션의 회장을 지내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77년 인터내셔널페이퍼에 부사장으로 발을 들여놓은 이후 20년 이상 민간기업에 몸담았기 때문에 기업인쪽에 가깝다.
부시정권의 초대 재무장관에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는 ''감세안 추진''의 행동대장 역할을 맡아야 할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민주, 공화당으로 양분된 상원과 감세안 반대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감세안 관철까지 넘어야 할 산은 험난하다.
오닐 내정자는 그린스펀과 막역한 사이여서 이런 난국을 뚫고 감세안을 추진하는데 FRB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무장관으로 확실시되는 돈 에번스(54) 공화당 선거본부장은 부시의 핵심 가신(家臣).
석유가스회사인 톰 브라운의 사장이기도 한 그는 부시 선거자금 1억달러 모금에 큰 역할을 했다.
지난 18일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지명된 앤드루 카드(52)는 부시행정부 시절 교통부장관, 백악관 비서실차장 등을 역임한 대표적인 ''아버지 부시''의 사람.
93년부터 99년 초까지 미국 자동차업계의 간판 로비단체인 전미자동차제조업체연합(AAMA)의 회장을 지냈으며 이어 99년부터는 GM 부사장으로 재임했었다.
90년대 대부분을 미국 자동차업계 이익의 대변자로 활약하면서 한국에도 수차례 방문, 거센 개방압력을 넣었던 인물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두가지다.
첫째 월가경험이 전혀 없는 제조업 경영자 또는 로비스트 출신이란 점이다.
따라서 미 기업들의 충실한 대변인 역할을 해줄 만한 인물들이다.
둘째 이들은 하나같이 미 기업들의 수출확대 옹호론자들이다.
한국 등 미국의 무역상대국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시장개방압력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미국의 과거 8개 정권중 5개 정권이 월가출신 뱅커들을 재무장관직에 앉혔다.
클린턴 행정부시절 재무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루빈은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다.
로렌스 서머스도 월가는 아니지만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경험을 갖고 있었다.
이런 관행에 비춰보면 재무-상무장관에 백악관 비서실장까지 업계 인사를 앉힌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전문가들은 ''친기업 정책''을 펴겠다는 부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월가의 표정은 떨떠름하다.
경제브레인을 굴뚝산업 경영자들에게 빼앗겼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
업계출신에게 경제정책을 맡겼으니 ''강한 달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될 것이란 우려에서다.
요즘 미국 경기둔화나 주가급락의 핵심에는 ''기업들의 실적악화''가 자리잡고 있다.
기업들의 실적을 올려주는 가장 손쉬운 정책이 달러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달러가치가 낮아지면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생겨 장사가 잘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강한달러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 대변자들이 경제브레인이 되면 달러가치 하락을 방조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달러화를 평가절하시키지 않겠느냐는 게 월가의 시각이다.
약한 달러는 미 증시에 악재로 작용한다.
달러가치가 떨어지면 미 자본시장의 매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이다.
클린턴 정부의 간판 경제브레인이었던 루빈과 서머스 재무장관의 ''강한 달러'' 정책은 미국시장에 대한 외국투자자들의 신뢰도를 유지시켜 주는 버팀목으로, 인플레이션 예방약으로, 금리인상 억제제의 세가지 역할을 해왔다.
노혜령 기자 hroh@hankyung.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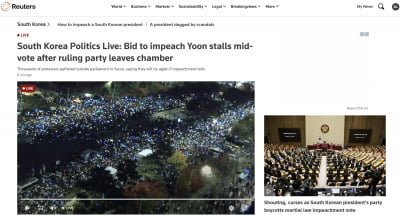
!['탄핵정국' 외신도 높은 관심 보여…日, 실시간 생중계까지 [종합]](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87114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