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로움 달래려 쓴 늙은이 끄적임이 역사가 됐네요"
경성사범 1회, 수석 졸업한 재원
고향은 평양, 결혼 후 부산 정착
김장·사투리 등 낯선 환경 기록

최근 국가기록원에 자신이 써온 일기장 56권을 기증해 화제가 된 임영자 씨(93·사진)는 경기 성남 국가기록원 서울기록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임씨가 세상에 내놓은 일기장은 1946~1947년, 196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57년치다. 그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목소리가 또렷했다. 폐암 투병 때문에 몸이 지쳐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인터뷰 내내 흐트러짐 없는 단정함과 밝은 표정을 잃지 않았다.
임씨는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지만 사실 ‘평범한 여성’은 아니다. 1922년 평양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로선 보기 드문 고학력 재원이었다. 훗날 서울대 사범대로 통합된 경성여자사범학교 1회 입학생이자 수석 졸업생이었고, 서울에서 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했다. “선생으로 일하는 게 참 보람있었어요. 교편 잡은 지 4년 만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았어요. 지금도 그때 제자들 몇몇과 연락하고 지냅니다.”
1943년 대구 출신인 남편과 결혼 후 교사직을 그만두고, 2년 뒤 부산에 정착하면서 임씨에겐 새로운 인생길이 펼쳐졌다. 평양 출신인 그에게 경상도 생활은 너무나 낯설었다. 시댁 가족 중에서도 북한 출신은 그 혼자였다. 그는 “김장하는 법과 사투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고향과 달라 처음엔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 외로움을 달래려 결혼 직후인 1943년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고향의 김치맛이 그리울 때, 두 딸을 둔 그에게 “아들을 왜 낳지 못하느냐”는 타박이 이어질 때, 보통학교 교사로 일했던 시절이 생각날 때, 뉴스를 봤을 때 등 매일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을 일기장에 써내려갔다. 임씨가 종이 위에 글씨로 읊조린 이야기는 씨줄과 날줄이 돼 생활의 역사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옷감이 됐다. “처음엔 만년필로 썼다가 나중에 ‘모나미 볼펜’이 나온 뒤엔 그걸로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요즘엔 펜이 좋은 게 많이 나와 글쓰기도 한결 편해졌죠.”
국가기록원에 일기장을 기증한 이유는 경운박물관 부관장인 큰딸 최경자 씨를 비롯한 주위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 임씨는 “국가기록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내 일기장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가져가는 걸 보는데 감개무량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는 지금도 일기를 쓴다. “몸이 덜 힘들고 정신이 맑을 때면 꼭 글을 쓴다”며 “항암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메모지와 펜을 챙겼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잘살아왔고, 아이들과 손주 모두 잘 지내고 있어 행복합니다. 이제 저세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몸, 하늘이 날 데려갈 때까지 일기장을 손에서 놓지 않을 겁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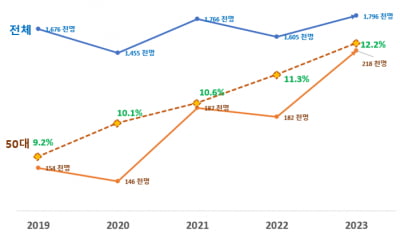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단독] 대법원, 13년 만에 '솜방망이' 사기 양형기준 손본다](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2.2500259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