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과장&이대리] 주 52시간 근무시대 직장인들 ‘동상이몽’
PC 꺼지면 노트북 들고 카페로…워라밸 '그림의 떡'이네
'저녁 있는 삶'에 웃음꽃
"자기계발 기회"…학원 북적
유연근무제 덕에 출퇴근 자유로워져
워킹맘 "육아에 여유 생겼다"
'저녁 굶는 삶'에 속앓이
대체휴가 써도 전화·카톡 폭주
"오히려 근로조건 더 나빠져"
특근·잔업 규제로 수당 대폭 깎여
"월급 메우려면 대리운전 뛰어야"
가족과 보내는 시간 늘어 “그저 웃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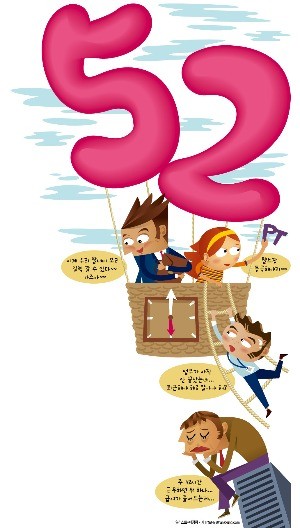
정보기술(IT) 회사에서 일하는 박모 사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덕에 이달부터 막 돌이 지난 딸 육아를 아내와 반씩 부담하게 됐다. 월 단위로 평균을 내서 40시간이 넘지 않도록 하는 회사 방침 덕분이다. 어떤 주에 50시간을 일하면 다른 주엔 30시간만 일해도 되는 식이다. 박 사원은 “최근 아들까지 생겨서 육아 걱정이 많았다”며 “어차피 특정 주간에 일이 몰리기도 하니 평소 오후 3~4시면 퇴근해 육아에 전념한다”고 즐거워했다. 건설회사에 다니는 ‘직장맘’ 차 과장 역시 회사의 주 40시간 근로시간 권장으로 기대에 부풀어 있다. “첫째 아들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제대로 숙제 한번 봐줄 시간이 없었어요. 정시 퇴근만 가능해져도 아이에게 더 신경 써줄 수 있겠죠?”
퇴근해야 해? 말아야 해? 여전히 혼란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됐지만 묘한 부서 분위기 때문에 이른 퇴근을 주저하는 사례도 있다. 시중은행에 다니는 김 대리는 다음달 등록한 토익학원을 취소할까 고민에 빠졌다. 부장의 회식 폭탄이라는 예기치 못한 난관을 만나서다. 평소 회식을 업무의 연장이라고 주장하던 김 부장이 “이제 회식은 업무가 아니라 친목도모로 주 52시간 근로와 관계가 없으니 친목도모하러 가자”고 너스레를 떤다.
대기업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윤 과장은 오후 6시 회사 컴퓨터가 꺼진 뒤 남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회사 근처 카페를 전전한다. 회사가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근무시간만 줄고 업무량은 그대로기 때문이다. 그는 “왜 멀쩡한 회사를 놔두고 매일 저녁 카페 빈자리를 찾아다녀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워라밸은커녕 생활이 더 불편해졌다”고 토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계획을 공공연히 말했다가 ‘원래부터 일하기 싫어했던 직원’으로 낙인 찍혀 당황하는 김과장 이대리들도 있다. 화학회사에 다니는 김 사원은 몇 주 전 부서장이 퇴근 이후 뭘 할지를 묻자 “사진 동호회에 가입했다”고 답했다가 곤혹스러운 상황을 겪었다. 다른 사람들은 “51.999시간 일하겠다” “꿈에서 일 생각을 해 효율을 높이겠다”는 식으로 답했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 과장은 최근 직장 상사에게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가 면박을 당했다. 상사가 “근로자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며 “놀 궁리만 하면 일은 언제 하느냐”고 한 것이다. 그는 “회사 평소 모습을 보면 시행할 때가 돼도 순순히 하지 않을 것 같다”며 “다른 기업은 어떻게 하는지 눈치 보고 최대한 규정을 피할 방법을 찾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빠져나가는 인력·줄어드는 임금에 한숨만
주 52시간 근무를 마냥 반기지 못하는 김과장 이대리들도 있다. 대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김모씨는 6월부터 근로 단축을 위한 특근과 잔업 규제로 연간 급여가 600만~1000만원가량 줄게 생겼다. 김씨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보너스도 삭감됐다”며 “줄어든 급여를 채우기 위해 야간 대리운전을 할 생각”이라고 한숨 쉬었다. 인천에 있는 중견기업 D사의 최 이사 역시 생산직 직원들이 근로시간 단축 문제로 회사를 떠나고 있어 골치다. 최 이사는 “서울에 있는 기업이 아닌 탓에 인력 수급이 어려운데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더 줄어 구인난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소연했다.
허울뿐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분통을 삼키는 이들도 있다. 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 업체에서 고객사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최 대리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조건이 더 나빠질까 걱정이다. 유지보수 업무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에도 당번을 정해 출근했지만, 이제 휴일에 출근하면 대체휴가를 쓰기로 했기 때문이다. 최 대리는 “대체휴가를 쓰고 있지만 밀려드는 고객사 전화 문의에 대응하다 보면 출근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휴일수당만 깎였다”고 씁쓸해했다.
어떻게든 일을 더 하려는 상사 밑에 있는 회사원들은 여전히 ‘좌불안석’이다. 무역상사에 다니는 주 대리는 “얼마 전 팀장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보고서는 지금까지 주말에 봐왔으니 이제는 퇴근하고 봐야겠다’고 말해 식겁했다”며 “아랫사람들도 가벼운 업무는 집에서 하길 바랄 것 같아 겁이 난다”고 말했다. 전자회사 재무팀에서 일하는 김 대리 역시 6월부터 주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으면 회사가 ‘강제퇴근’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남의 집 얘기다. 달라진 건 일하는 장소일 뿐 자발적(?)으로 미리 퇴근카드만 찍고 야근하는 분위기다. 남은 업무가 눈에 밟혀 그 역시 퇴근카드만 찍은 채 자리에 앉는다.
김 대리는 “쉬어야 하는 집에서까지 업무전화로 시달린 통에 오히려 최근 몸살이 났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주목! 이 책] 토카타](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4751.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