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현정 기자의 '패션읽기'] '드레스 코드'
''초대의 글 장소 때…''.
흔한 문구로 이어지던 행사안내의 맨 밑줄에 눈이 멈췄다.
''드레스 코드-블랙 & 골드''.
참석자들에게 검은색과 황금색을 취향대로 맞춰 입고 오도록 주문한 것.
드레스 코드(Dress Code)란 복장규정을 말한다.
넓게는 집단이나 사회의 옷차림을 정한 것이다.
좁게는 파티 모임 등에서 특정한 옷차림을 요구하는 것이다.
2∼3년전까지만 해도 드레스코드는 찬밥 신세였다.
하루가 멀다하고 행사와 파티가 열리는 패션계에서조차 외면당했다.
그러나 요즘들어 달라지고 있다.
최근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샤넬행사때는 참석자들이 ''블랙 & 화이트''나 ''샤넬풍''으로 쇼를 관람했다.
청담동 레스토랑에서 열린 여성복 브랜드 ''오브제'' 패션쇼에서도 손님들이 ''뉴욕풍 정장''으로 객석을 지켰다.
반대로 드레스 코드를 외면한 사람은 바늘방석에 앉아 있어야 했다.
패션계뿐만 아니다.
일반모임에서도 드레스코드를 지정하는 사례가 흔하다.
한 라틴댄스 동아리에서는 월말 모임때 ''파티정장''을 요구하고 있다.
남녀간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에서도 드레스 코드는 빼놓을 수 없다.
''옷은 아메리칸 캐주얼로 자연스럽게…''라는 식이다.
드레스 코드가 왜 이처럼 급속히 퍼지고 있는가.
소속감의 공유를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다.
신세대들은 규정된 옷을 입음으로써 자신이 집단에 소속돼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한다.
다른 집단과의 차별화로 우월감도 느끼고자 한다.
드레스 코드가 신세대의 ''집단개성''주의에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이다.
파티문화의 정착도 또다른 요인의 하나로 꼽힌다.
기성세대들은 파티가 부담스럽다.
''파티''라고 하면 서로 얘기하며 춤추고 노는 장면을 떠올린다.
마시고 먹는 망년회 등과는 다르게 본다.
그러나 신세대는 다르다.
그들은 파티를 좋아한다.
평범한 행사보다는 특이한 주제로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드레스 코드는 파티를 재미있고 멋지게 만든다.
잘 모르는 사람끼리도 서로 통할 수 있게 한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드레스 코드 붐이 미국이나 유럽에서 처럼 문화의 하나로 자리 잡을수 있을까.
아니면 한때의 유행에 그치고 말 것인가.
현재로서는 정답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드레스 코드가 새로운 풍속도의 하나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다.
sol@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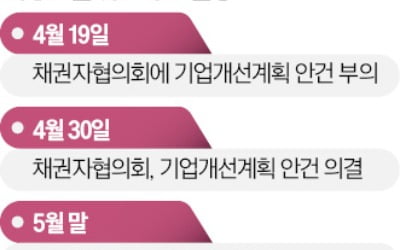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이 아침의 바이올리니스트]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동양인 최초 종신악장](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5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