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첫 한국 전통사찰 분황사···세 사람의 땀방울이 묻어있다
한옥·단청·불상 통해
한국 불교의 美 전달
콘크리트로 한옥 곡선미 구현
"코로나19·폭염에 유서까지 써놓고 일해"
항공규제로 현지서 안료 구하고
불상 보존 위해 옻칠 하기도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고층 빌딩, 아파트 등 건설을 담당하다가 약 20년째 한옥을 짓고 있다. 콘크리트 건물 건설 경험, 목조 한옥 건설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대웅전을 지을 수 있었다.
박씨는 “콘크리트로 한옥의 곡선미를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다”며 “특히 정면에서 보면 학이 날아가는 것 같은 처마의 허리곡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공포. 공포는 한옥 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해 기둥머리에 대는 구조물로, 보통 나무로 짜 맞춘다. 분황사는 공포도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그는 공포가 무사히 올라갔을 때 "혼자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그는 숱한 어려움 속에도 사고 없이 대웅전을 완공했다는 데 자부심과 감사함을 드러냈다. "오직 부처님 집을 지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했습니다."


부다가야=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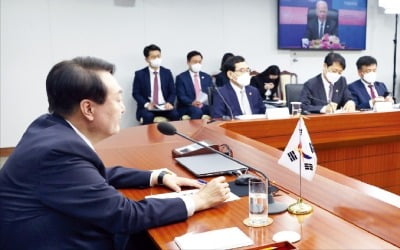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신간] 나무 내음을 맡는 열세 가지 방법](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ZK.3653470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