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칠레의 사막, 제주의 바람, 인도의 땅이 그린 그림입니다
모란미술관 김아타 '자연하다'
카메라 버리고 캔버스 택한 '사진계 전설'
세계 100여 곳 바다·땅·산에 캔버스 숨겨
포탄 사격 후 찢긴 잔해로 작품 만들기도
"인간이 만든 야만의 역사도 자연의 일부"

김아타는 2000년대 중반 ‘뉴욕의 신화’를 만든 작가다. 긴 시간의 노출로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를 찍은 사진들을 포개 예술계를 뒤흔들었다. 카메라의 셔터가 오랜 시간 열려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사라지고 풍경만 남았다.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진다’는 것을 사진으로 증명했다. 12개 도시에서 각각 1만 컷의 사진을 찍어 포개고 포갠 ‘인달라 시리즈’도 그랬다. 결국 남은 것은 잿빛이었다. 런던도, 파리도, 델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전설이 되어가던 그때, 그는 자신을 부검하기로 했다. 멈출 것인가 스스로 진화할 것인가의 갈림길에서 후자를 택했다. 그는 카메라를 버리고 캔버스를 들었다. 그리고 ‘자연하다(On Nature)’ 프로젝트로 돌아왔다. 미술계에선 ‘요즘 김아타 뭐 하는지 아냐’고 묻는 말이 많았다. 10여 년의 시간을 응축한 김아타가 ‘자연하다’의 첫 개인전을 연다. 500점의 작품 중 28점이 올해 30주년을 맞아 재개관한 경기 남양주 모란미술관에 걸렸다. 이달 19일 개막해 10월 10일까지 이어진다.
김아타의 ‘자연하다’를 본 고(故) 이어령 선생은 작고 전 “‘자연하다’는 우주에 널어놓은 빨래와 같다. 김아타는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있다”고 했다.
두 번의 사계, 자연이 그린 추상
김아타는 12년 전부터 세계 100여 곳을 돌며 숨바꼭질하듯 캔버스를 숨겼다. 바닷속, 산꼭대기, 종교 성지, 땅속 모두 작업실이 됐다. 잠자리의 알, 민들레 홀씨, 붉고 노란 낙엽, 떡잎에 밀려 올라온 호박씨, 비와 바람, 낙엽과 새싹, 태양과 파도, 땅속 미생물까지 자연을 이루는 모든 것이 화가가 됐다. ‘그곳’의 시간과 자연은 텅 빈 캔버스에 마음껏 그림을 그렸다. 2년여의 시간이 지나 자연에서 돌아온 캔버스 조각은 김아타를 울게 하고, 웃게 했다.“모든 것의 끝에 자연이 있었다. 먼 길을 돌아 자연으로 돌아왔다. 나(사진가 김아타)를 죽여야 내(예술가 김아타)가 사는 길이라고 믿었다.”

유채꽃이 두 번 피고 질 동안 제주의 바람은 캔버스를 찢어놓았고, 사막의 모래바람은 캔버스에 모래 가루들을 박제했다. 베네치아에 홍수가 났을 땐 캔버스도 물에 잠겼다. 싯다르타가 붓다가 된 부다가야 마하보디 사원의 캔버스는 다른 어떤 장소의 것들보다 더 심하게 찢겨 있었다. 함께 땅을 파고 묻었던 주지 스님은 붓다를 대하듯 캔버스에 합장했다.
야만의 역사도 자연의 일부다
‘자연하다’의 작품 중 압도적인 스케일을 보여주는 것은 포(砲)가 그린 그림이다. 군대가 사용하는 포 사격장에 캔버스를 설치하고 캔버스가 포탄에 찢기고 불탄 잔해들을 수습했다. 강원 홍천 포 사격장에 설치한 캔버스는 군당국 허가를 받는 데만 3년이 걸렸다. 첩보 작전을 연상하게 할 만큼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했다. 포탄이 하얀 캔버스 위에 작렬할 때 그는 처연한 마음과 끔찍한 기분이 교차했다고 했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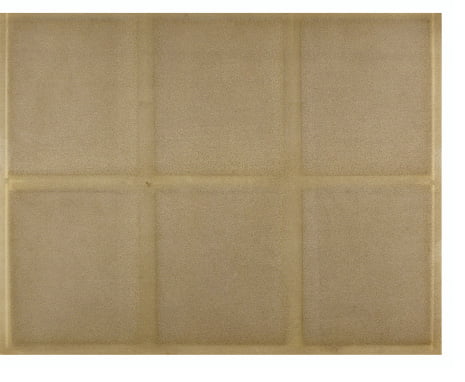
김아타는 포 사격장에서 억지로 건져낸 캔버스 파편들을 짜깁기하고, 그 위에 색을 칠했다. 검정과 빨강. 그는 검정은 가장 화려하고 감각적이지만 가장 위험한 색이라고 했다. 아무것도 뺄 수 없는 가장 낮은 위치의 색이면서, 아무것도 더할 수 없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색. 빨강은 야만의 결과물로서 피를 상징한다.
“우주정거장에도 캔버스를”
설치와 수거와 보존 처리 등 한 작품에 5~10년이 걸리는 ‘자연하다’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형이다. 자연이 그림을 그리도록 마음먹었을 때, 그는 서양과 동양의 사상을 잉태했던 곳과 야만적 과거를 간직한 곳들을 우선 떠올렸다. 종교의 성지,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인디언보호구역 등이 그랬다. 허가받지 못해 아쉽게 철수한 곳도 많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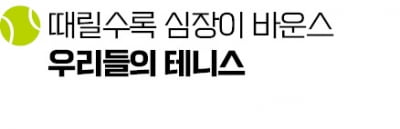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