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마우스 물고…절망의 늪에서 詩를 잡다
결혼 1주일 전 교통사고
어깨 아래로는 감각 없어…약혼 깨지고 폐인생활
희망의 증거가 되다
성당 자원봉사자와 결혼 "창밖의 별 보고 살아야죠"

시인 황원교 씨 얘기다. 그는 최근 시집 《오래된 신발》(문학의전당)을 발표했다. 손이 아닌 얼굴로 시를 쓴 지 17년 만에 낸 세 번째 시집이다. 손발을 쓰지 못하는 그는 누워서 ‘헤드 마우스’로 시를 쓴다. 안경에 부착된 센서를 모니터에 달린 렌즈가 인식해 얼굴을 움직이면 마우스 커서가 따라 움직인다. 그렇게 화면에 떠 있는 자판을 하나하나 눌러 글을 완성한다.
힘겹게 썼지만 그의 시는 어둡지 않다. 오히려 다른 시인들보다 짙은 서정을 담았다.
‘아프면 아프다고/그리우면 그립다고 말하자/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고/설사 기약 없는 약속이라 할지라도/윤회와 환생을 굳게 믿으며/선운사 꽃무릇은 붉게 핀다’(‘상사화’ 부분)
교통사고 후 7년간 그는 폐인으로 살았다. 자신의 모습과 신세가 부끄러워 고향(강원 춘천)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여동생이 시집 가 살고 있던 충북 청주로 내려가 절망으로 소일했다. 삶의 자세가 바뀐 건 어머니가 과로로 돌아가시면서부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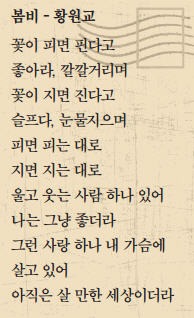
마침 그때 읽은 소설 ‘빛나는 성벽’의 한 구절이 그의 가슴을 깨웠다. ‘감옥에 사는 두 사람, 한 사람은 진흙탕을 바라보고 다른 한 사람은 창밖의 별을 바라본다.’
그는 거실에 누워 마우스 스틱을 입에 물었다. 화면 속 키보드를 눌러가며 시를 썼다. 그 시간만큼은 지독한 고통과 결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고교 문예반 시절이 떠올랐고 사고 전 서울 광화문에 있는 직장(동아생명)을 다닐 때 퇴근하자마자 교보문고로 향했던 일도 생각났다.
1996년 크리스마스 전날 충청일보로부터 신춘문예 당선통보를 받았다. 자신을 저버렸다고 생각했던 세상이 그에게 시인이란 이름을 붙여준 순간이다.
시를 통해 희망을 찾은 후엔 인연도 찾아왔다. 2001년 9월 그는 7년 동안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1주일에 한 번씩 집으로 와 자원봉사를 하던 성당 청년부 교사 유승선 씨와 결혼했다. 수녀원에 들어가려던 유씨는 수도자의 길을 포기하고 황 시인과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내에게도 병마가 덮쳤다. 2005년 유방암 3기 판정을 받고 완치된 아내 유씨는 지난해 12월 또다시 난소암 3기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다. 오는 21일 부부의 날을 맞는 황씨 부부의 심정은 애틋할 수밖에 없다.
“저를 대신해 보험설계사 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 온 아내예요. 암과 싸우면서도 저를 지아비라고 손수 떠먹여주고 씻기고 입혀주고…. 얼른 완치돼 돌아오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할 겨를이 없다”며 굳건히 살아가고 있다. 최근엔 시뿐 아니라 소설도 쓰고 있다. 그가 쓰고 있는 소설 ‘H씨 여명기’는 나이 든 아버지와 장애인 아들 간의 애증관계를 줄기로 고령화 사회와 장애인 문제를 고발하는 체험적 작품이다.
“한 줄을 쓰더라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삶은 실존 그 자체잖아요. 아무리 부조리하고 모순투성이인 세상이라고 불평해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있다는 것만한 진실은 없잖아요. 판단할 수 있는 머리와 느낄 수 있는 가슴이 있어 감사해요.”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책마을] '손흥민 아버지' 손웅정의 책…<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 1위](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538912.3.jpg)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