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용틀임' 25시] (20.끝) '특별취재팀 취재후기'
지난 5월 어느날 편집국장으로부터 취재지시를 받은 순간부터 상하이 특별취재팀은 고민에 빠졌다.
"중국과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이라면 한두번쯤은 둘러봤을 상하이, 게다가 푸둥개발 10년을 맞아 국내언론에도 제법 소개된 상하이를 어떻게 조명해야 소위 ''산뜻한 기사''가 될까. 도대체 어디를 어떤 각도에서 취재해야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은 취재팀이 상하이 훙차오(虹橋)공항에 내릴때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팀이 지난 6월 20여일 동안 상하이 골목골목을 헤집고 다니면서 그 부담감은 어느덧 두려움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두려움은 뉴욕 맨해튼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바뀐 푸둥의 화려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화려함속에 가린 상하이 시민들의 국제화된 마인드, 상하이 공무원들의 청렴함, 비즈니스맨들의 노련한 장사꾼 기질을 접할 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매주 일요일 오전 루신공원에 모여 영어회화를 공부하는 상하이런(上海人), 잠옷바람으로 도시락을 싸들고 객장을 찾은 주식투자자를 만났을 땐 입에서 탄성이 절로 나왔다.
상하이는 분명 꿈틀거리고 있었다.
푸둥의 화려한 빌딩숲 밑으론 동북아 경제의 패권을 잡으려는 중국의 야망이 마그마처럼 움직이고 있었다.
그 마그마에서 분출된 힘은 곧바로 세계로 뻗어나갈 기세였다.
취재기간중 우연히 만난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만간 중국 상하이와 일본 고베, 한국의 부산이나 광양이 한판 붙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상하이가 제일 먼저 치고 나간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의 25시를 취재하면서 문득문득 ''과연 서울은 지금 몇시인가''라고 반문한 것도 그 때문이다.
이 시리즈가 취재팀이 보고 느낀 상하이의 실체와 잠재력을 얼마나 실감나게 전달했는지에 대해선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낀다.
그러나 이 시리즈가 중국을 좀 더 알고 한국기업들이 중국과 세계로 진출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
중국투자의 물꼬를 상하이 화둥(華東)지역으로 돌려야 할 때라는 취재팀의 결론이 설득력있게 전달됐기를 바랄 뿐이다.
취재에 도움을 준 상하이 시정부 외사판공실과 현지 한국기업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
또 시리즈가 나간 지난 2개월 동안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독자 여러분께 고마움을 표시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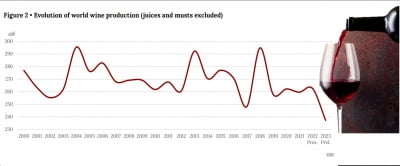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