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콜옵션 놓고 당국 오락가락…韓 금융 '신뢰 추락' 불렀다
외화채 시장 혼란…그 뒤엔
금융당국 'RBC 비율'에 집착
한시 규제 풀어 상환유도 했어야
개별기업 재정 건전성과 별도로
'한국시장 좋지않다' 신호만 준셈

흥국생명이 9일 5억달러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전액 조기 상환하기로 하면서 외화 채권 시장이 정상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당국의 오판으로 불필요한 시장 혼란과 신뢰도 하락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정권 교체기 금융당국 수장들이 잇따라 바뀌고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사가 이어지면서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흥국생명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2017년 발행한 5억달러 규모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5년 만기일인 9일 조기 상환(콜옵션 행사)하지 않겠다며 당국의 승인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기획재정부는 협의 끝에 흥국생명 측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유는 있었다. 시중금리 급등에 따른 보유 채권 가격 하락 탓에 흥국생명의 지급여력(RBC) 비율은 이미 금감원의 권고치인 150%선을 밑돌았다. 이렇게 되면 현 감독규정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의 조기 상환이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해외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것이었다. 13년 전 우리은행도 4억달러 규모 후순위채의 콜옵션 행사를 연기했다가 대외 신인도 하락 등 거센 후폭풍에 직면해 부랴부랴 이를 철회했다. 하지만 최근의 사정은 그때와는 달랐다. 도이체방크 등 해외 은행에서도 신종자본증권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선례가 있는 데다 호주 금융당국이 최근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결국 당국의 양해를 얻어낸 흥국생명은 이달 1일 공시를 통해 콜옵션 미행사 방침을 알렸다. 대신 ‘스텝업 조항’을 발동해 현재 연 4.475%인 표면 금리를 연 6%대로 올려주겠다고 밝혔다. 차환을 위해 물어야 하는 연 10%대 금리와 비교하면 턱없이 낮았다.
싱가포르나 홍콩 등 국제 금융시장이 이런 꼼수를 모를 리 없었다. 신뢰는 깨졌고 흥국생명은 물론 신한은행 한화생명 등 국내 유수의 금융회사들이 발행한 외화 표시 채권(KP물)에도 불똥이 옮겨붙었다. 흥국생명 신종자본증권은 무려 30% 급락한 가격에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당황했다. 부랴부랴 지난 3일 각 보험사 재무담당자를 불러모아 대책을 논의했다. 코너에 몰린 흥국생명은 대주주를 동원해 9일 신종자본증권을 정상 상환하겠다며 꼬리를 내렸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금융당국은 시종일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행 감독시스템이 RBC 비율에 근거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는 내년부터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단순히 RBC 비율을 근거로 흥국생명 사태를 묵과한 건 명백한 판단 미스”라고 했다. 보험 부채의 시가 평가를 골자로 한 IFRS17이 도입되면 고금리 기조에서 보험사들의 부채가 줄고 자본이 늘어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된다.
금융위가 올 상반기 이와 비슷한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잉여금’을 RBC 비율에 일부 반영해주는 조치를 시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업계에서도 금융당국이 이처럼 오락가락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내 증권사 채권담당 관계자는 “당국이 애초부터 흥국생명과 잘 협의해 상환을 유도했다면 별다른 충격 없이 지나갔을 텐데 사고는 사고대로 치고 실리는 실리대로 잃었다”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금융의 신뢰만 깎아먹는 최악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서형교 기자 hglee@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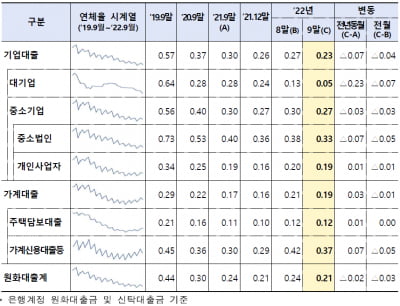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윤한결의 한경아르떼필과 브람스 교향곡](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687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