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FO Insight] ESG 밸류체인과 금융전쟁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즈(FT)가 사용한 이 한 문장만큼 지금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 열풍을 잘 표현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인수합병(M&A) 등 기업투자, 부동산, 인프라 등 자산군을 가리지 않고 ESG는 현 시대 투자의 핵심 테마(주제)로 떠오른 모양새다.
8조달러에 육박하는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을 비롯해 블랙스톤, 맥쿼리 등 글로벌 운용사들은 ESG를 핵심적인 투자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들의 자금줄인 글로벌 연기금, 국부펀드 들 출자자(LP)들 역시 한결 같이 ESG 확대를 외치고 있다.
◆자산운용부터 인덱스 개발까지..ESG 주도권 경쟁 '치열'
열기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다. 미국 금융 컨설팅업체 오피마스에 따르면 2014년 21조4000억달러 수준이던 전 세계 ESG 자금 규모는 올해 6월말 40조5000억달러(약 4경5000조원)로 2배 가량 증가했다. 자본시장의 큰 손인 글로벌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투자 원칙으로 ESG를 중심으로 한 책임투자 원칙을 받아들이면서 벌어진 현상이다.
커져가는 투자 열기만큼 자금의 투자 방향을 좌우하는 '인덱스(index, 지수)'를 둘러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세계적인 지수 산출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을 비롯해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스탠더드앤푸어스(S&P), JP모건 등이 경쟁적으로 ESG 인덱스 개발에 뛰어들었다.
지수 추종을 통해 시장 수익을 추구하는 인덱스펀드나 ETF(상장지수펀드) 등 패시브 투자자들은 이 같은 인덱스를 벤치마크로 활용하고 이용료를 지불한다. 연기금과 국부펀드 등 큰 손들 역시 패시브 투자를 비롯한 기금운용 전반의 성과 평가를 위해 MSCI 등 지수산출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년 상당한 규모의 이용료를 낸다.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에 따르면 ESG를 지표로 삼은 ETF는 2015년 60개에서 올해 400개를 넘겼다. ESG 투자가 커질수록 자동으로 돈을 버는 '밸류체인'의 꼭대기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모든 자산 가격 재조정된다...기업 승패 ESG서 갈릴 것"
전문가들은 투자 대상인 기업 입장에서도 금융시장의 변화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한다. 기업이 ESG 측면에서 얼마나 높은 평가를 받는지, 그 결과 글로벌 자금의 선택을 받는 ESG 인덱스에 포함될 수 있는지가 그 기업의 기업가치 또는 주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헨리 페르난데즈 MSCI 회장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ESG는 기업과 투자자에게 있어 도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선도하느냐의 문제"라며 "모든 재무적, 실물 자산의 가격이 재조정될 것이고 승자와 패자가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필립 힐데브란트 블랙록 부회장 역시 "앞으로는 ESG 관련 ETF(상장지수펀드) 인덱스에 포함되는지가 향후 기업 가치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금 조달이나 M&A 등 기업의 구조재편 작업도 ESG와 무관할 수 없다. 글로벌 사모펀드 블랙스톤은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15% 이상 감축할 수 있는 기업에만 투자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 주요 상장사 수백곳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최근 주주활동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본재조정, 경영권방어 방식까지 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ESG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는 돈을 구할 수도, 사업 재편을 할 수도 없는 세상이 도래한 셈이다.
◆의구심도 여전..."한국 환경에 맞는 기준 정립해야"
다만 ESG가 기업과 투자자의 '수익성'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가능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원칙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상당하다. 한 국내 연기금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카지노 리조트를 두고 어떤 기관은 도박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죄악주로 평가하고 또 다른 기관은 국민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시설이라며 높은 ESG 등급을 매긴다"며 "아직 제대로된 기준이 없다보니 벌어지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기금 관계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ESG 자체에 깊이 공감한다기보단 글로벌 자금이 여기에 맞춰 움직이니 우리도 장래의 자금 회수(엑시트)를 위해 따라갈 수 밖에 없다"며 "ESG를 외치는 해외 투자자들도 사석에선 '결국 지수 개발사들이나 글로벌 ETF로 수수료를 쓸어담는 일부 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고 털어놨다. ESG 열풍이 그저 순수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국가가 흐름에 역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 투자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한 공제회 CIO는 "ESG를 중심으로 투자의 표준이 새로 쓰여지고 있다"며 "아직 명확히 정해진 표준이 없는 만큼 전략적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한국 환경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외국 자본의 규칙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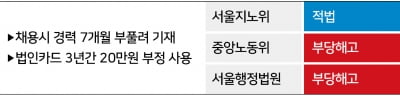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