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 40% vs 50%…소득대체율 놓고 갈린 연금개혁 초안
보험료율 9→15% 인상엔 공감
소득보장은 여야측 위원간 이견
45% 중재안에 30% 하향안까지
국회에 복수안 제시 가능성 높아

자문위는 본격적으로 개혁 방안을 논의할 연금특위에 논의 초안을 만들어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에서 잘못된 안이 나오면 특위에서도 어긋난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당초 자문위에서는 여당 측 위원들이 A안, 야당 측 위원들이 B안을 대표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소득대체율과 관련된 의견차가 지나쳐 중재안 성격으로 C안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안정을 강조하는 위원들은 여기에 반발해 연금 지급액을 대폭 낮추는 D안까지 내놨다.
자문위원 대다수는 보험료율을 15%까지 인상하자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15%’는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할 때 기금 고갈 시점을 최대 2073년까지 늦추는 안으로 국민연금연구원 등이 제시한 수치다. B안이나 C안처럼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고갈 시점은 다시 크게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
이를 놓고 자문위원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결론을 못 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주 특위가 자문위에 넘기는 안도 단일안이 아니라 복수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로 구성된 특위는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심지어 일부 야당 측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유력하게 논의됐던 개편안보다도 ‘더 받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2019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수안’이라며 발표했던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5%’ 안보다 소득대체율을 5%포인트 높여 제시한 것이다. 보험료율을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대폭 인상하면 지급액이 늘어 국민연금 개혁 효과가 반감된다.
다만 최종 특위에 제출할 숫자는 소폭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자문위원은 “복수안을 제시하더라도 비슷한 수준이라야 현실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예컨대 ‘소득대체율 현행 유지’를 고수한 A안은 ‘42.5%’ 수준으로, B안은 ‘소득대체율 50%’에서 ‘45%’ 정도로 조율될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다. 보험료율도 마찬가지다.
이번 개혁안에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높이는 안도 담길 전망이다. 현행 59세인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높여 수급 개시 연령(2033년부터 65세)과의 공백을 줄인다는 이유에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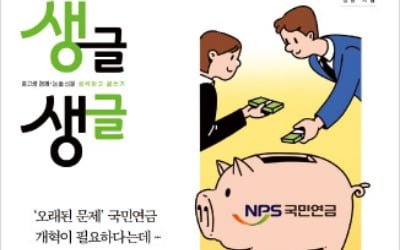

![[속보] 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 정부안 아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1/ZN.32498270.3.jpg)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