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차이나리포트] 2부 : (4) 탄력받는 IT코리아의 힘 … '게임韓流' 제2부흥 노린다
국내 회사들은 신천지 게임시장에 흥분했다.
시장도 금세 장악했다.
그러나 이도 잠시. 중국 회사들의 자체 게임 개발로 한국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떨어지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의 절반인 30~40% 수준까지 밀렸다.
'한국 게임,중국시장 퇴출 위기'라는 보도도 쏟아졌다.
게임뿐이 아니다.
인터넷,정보시스템,통신 등 다른 IT서비스 분야에서도 중국 비즈니스가 급부상했다가 식곤 했다.
한국의 IT서비스는 과연 중국에서 설 땅을 잃었는가?
지난달 말 상하이 신국제전람관에서 열린 게임전시회 '2006 차이나조이'.이 전시회는 중국 게임회사들의 부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었다. 그러나 한국 게임회사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 자리이기도 했다.
부스를 설치한 중국회사는 띠지우청스 스지텐청 지우요우왕 텐롄스지 등.이들에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 게임을 유통시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띠지우청스는 뮤와 선(웹젠),스지텐청은 카트라이더(넥슨),지우요우왕은 오디션(T3엔터테인먼트),텐롄스지는 프리스타일(JCE)의 유통권을 따내 커 가고 있다.
"중국 게임시장의 뚜렷한 흐름은 간단하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캐주얼게임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디션 프리스타일 카트라이더 등 한국 게임이 그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 게임 전문회사 샨다의 쑤궈져 부총경리의 설명이다.
카트라이더 오디션 비앤비 메이플스토리 등은 동시접속 50만~60만명을 기록하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한때 시장을 석권했던 '미르의 전설'만 못하지만 나름대로 제2의 부흥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관람객의 발길을 잡아둔 또 다른 부스는 웹젠과 위메이드다.
이들 회사는 각각 중국 현지에서 개발,서비스를 앞두고 있는 일기당천(一騎當千)과 창천(蒼天)을 선보였다.
웹젠의 중국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철 이사는 "다양한 형태의 중국적 요소를 가미한 작품"이라며 "중국 게임유통회사의 합작 제의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게임전문 잡지인 게임월드는 "일기당천과 창천이 대형 온라인게임 분야에서 '미르의 전설'에 이은 또 다른 전설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도 '아크로드'(NHN) '귀혼'(엠게임) '헬게이트 ; 런던'(한빛소프트) 등 20여개 게임이 지금 중국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문제는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느냐다.
국내 게임회사들은 진출 초기 복잡한 유통구조 및 중국 게임 유통회사의 '횡포'로 재산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철저한 계약을 통해 매출액의 20~30%를 로열티로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미르의 전설'도 월 100만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꼭꼭 챙기고 있다.
일부 회사들은 중국 유통회사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 합작사 설립,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게임을 직접 서비스하기도 한다.
다른 IT정보서비스 회사도 실익 위주의 중국경영을 펼치고 있다.
SI(시스템통합)회사인 삼성SDS가 대표적인 사례.이 회사는 그동안의 백화점식 중국 사업에서 벗어나 지하철 자동요금징수(AFC)시스템에 특화하고 있다.
광저우 지하철 5개 노선에 시스템을 구축한 데 이어 베이징 톈진 등에서 모두 1억달러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
이 분야 시장점유율 35%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 꽉 막혀있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도 한국 기업의 참여가 기대된다.
SK텔레콤은 지난 6월 CDMA 이동통신사업자인 차이나유니콤의 전환사채 10억달러를 매입,안정적으로 중국 통신서비스 사업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현재 50여명의 인력을 베이징에 파견,유니콤의 통신서비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상하이와 베이징의 업계 전문가들은 IT서비스 분야에서 중국 비즈니스가 급랭해야 했던 이유를 '시장 규모에 현혹된 무모한 사업 때문'으로 분석한다.
장기적 전략 없이 당장의 이익만을 좇았기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지적이다.
SK그룹의 중국사업을 이끌고 있는 김상국 전무는 "IT서비스 분야 진출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먼저"라며 "그런 점에서 한국 IT서비스회사의 중국 진출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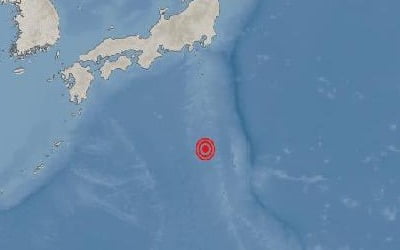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