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병 수렁'에 빠지나] 포퓰리즘에 기댄 '유럽식 복지모델' 국가재정 파탄 불러
'유럽식 복지모델'은 지구상의 이상향으로 통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이 완벽한 사회보장을 주장하며 내세운 이 슬로건은 지난 70년간 세계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된 목표이자 지상과제였다.
하지만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 재정위기는 이 같은 인식을 근본부터 송두리째 뒤바꿔버렸다. 복지는 더이상 '절대선(善)'이 아닌 자칫하면 국가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존재임이 분명해졌다. 유럽식 복지모델은 이제 따라배워야 할 모델이 아니라 뜯어고쳐야 할 개혁 대상으로 떠오른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5월25일자)은 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방되던 유럽의 사회복지 모델이 조만간 관 속으로 들어갈 처지에 놓였다"고 표현했다. 이른바 '복지병의 종말'을 예고한 것이다.
◆복지병이 잉태한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꼽힌다. 유로화 체제의 구조적인 결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에서부터 남유럽 국가의 정치 부패,방만한 재정운영 등이 원인이라는 해석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복지병에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단 생기고 나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제어되지 않고 질주하는 복지 수요,재정에 의존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근로의욕 저하,급증하는 세금으로 인한 경제활력 훼손 등으로 국가 경제와 재정이 결국 파탄이 나는 것이 복지병의 특징이다.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순한 금융이나 재정 문제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견고하게 구축됐던 유럽식 사회복지 모델의 근본적인 결함에서부터 잉태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국가들이 앓고 있는 복지병의 근원은 2차대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차대전 후 선거를 통해 잇따라 등장한 유럽의 사회당 정부들이 연금과 의료보험 지급 수준을 높이고 조건도 덜 까다롭게 하면서 '덜 일하고도 더 받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복지 제도가 도입되자 무임승차자들이 양산돼 부작용이 속출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하면서 몇몇 유럽 복지국가에서는 '실업이 괜찮은 직업'이라는 얘기가 통용될 정도"(김대철 국회 예산정책처 복지예산분석관)였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급속한 노령화는 복지병을 더 키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유럽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2050년까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에 경제활동인구 7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3명이 1명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노동생산성도 하락하고 있다.
박능후 경기대 교수는 "재정위기의 한 복판에 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급속히 높아지는 추세"라며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의 경우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최근 20여년간 2배(10.2%→20.5%)로 증가했다.
◆뒤늦은 후회
유럽국들은 재정위기를 계기로 복지병 치유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연금 지출 억제를 위해 지급 연령을 늦추는 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덜 내고 더 받는'복지를 '낸 만큼 받는'시스템으로 고치기 위해 세입도 강화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율을 높이고 사치세 및 녹색세금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이다. 스페인도 연금 인상을 동결하고 신생아 1인당 2500유로 세액감면 제도를 폐지했다. 공무원 임금도 최대 15%까지 삭감했다.
복지 개혁에는 서유럽 국가도 예외는 아니다.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31%로 가장 높은 프랑스는 과거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연금수령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췄던 것을 원상복귀시키는 연금법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은 연금 지급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2년 연장했고 영국도 최근 출범한 새 내각이 재정감축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30만개나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한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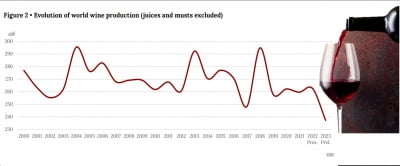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