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장학금도 '계층 갈라치기' 하나"…대학 "등록금 자율화 사실상 물 건너가"
13년째 등록금 못 올린 대학들
재정 더 나빠질라 '좌불안석'
26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반값 등록금’ 혜택을 받는 학생이 올해 62만2000명에서 내년에는 100만여 명으로 늘어난다. 전체 대학생 수가 올해 기준 약 21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정도가 등록금 지원 혜택을 받는 셈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대학생이 많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국가장학금 혜택 확대를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혜택을 줄 거면 모든 대학생에게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박모씨(22)는 “소득 6분위는 매년 수백만원의 장학금을 받고 소득 7분위는 한푼도 받지 못한다”며 “왜 이런 기준을 세워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이주원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의장은 “전대넷은 모든 학생의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등록금 금액 자체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줄곧 강조해왔다”며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큰데, 국가장학금을 통해 간접적으로 일부 학생의 등록금만 줄이는 것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연계해서 지원한다”며 “그간 가정환경이 어려운데도 장학금을 충분히 못 받던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등록금 자율화를 외쳐왔던 대학들도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정부 규제로 등록금이 13년째 동결돼 사립대의 재정 상황은 악화일로다. 2010년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51만4000원이었지만 작년엔 747만9000원으로 되레 줄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은 18.7%에 달했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 17일 “고등교육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가장학금을 확대해 청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으니, 대학들 입장에서 등록금 자율화를 요구하기는 어려워졌다”며 “정원감축 압박을 받는 와중에 등록금 인상이 힘들어진 만큼 대학의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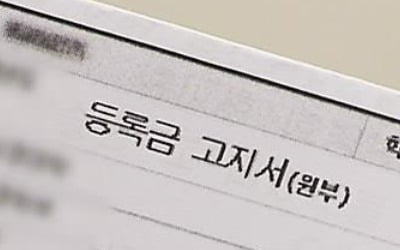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