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야 "한국의 고속성장 경험은 저개발국 원조 자양분"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야 씨(54·사진)는 17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는 ‘(원조를) 주는 나라’에 그치지 말고 ‘잘 주는 나라’가 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씨에게 지난 2년은 재충전과 도전의 시간이었다. 미국 터프츠대에서 인도지원 분야 석사학위를 받은 뒤 올 상반기 이화여대 국제학과에 초빙교수로 임용돼 ODA 관련 강의를 하고 있다. 유엔 중앙긴급대응기금,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정책 자문위원도 맡았다. 현장 중심의 민간단체에서 학계와 정책기구로 활동 범위를 넓혔다.
한씨는 2001년 월드비전 긴급구호팀장으로서 아프가니스탄에 갔을 때 한국의 힘을 느꼈다고 했다. 당시 원조금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아프간 측 대표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미국 유럽 등 공여국가 대표들은 아프간의 정책에 훈수를 두며 지원금을 전달했고 아프간 대표들은 말 없이 듣기만 했다. 한씨가 “한국도 50년 전 전쟁이 나서 모든 게 무너졌었다”고 첫마디를 꺼내자 분위기는 반전됐다. “한국도 해외 원조를 많이 받았어요. 그 원조를 마중물 삼아 4000만명의 국민이 열심히 펌프질해 쓰고도 남을 정도의 물을 길었습니다. 그 물이 아프간에 필요한 것 같아 마중물로 가져왔어요.” 이어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펌프질을 해 물을 길어달라”고 하자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그는 전했다.
한씨는 “한국은 식민지 경험이 있는 아프리카, 빈곤에 시달리는 저개발국가, 군부독재를 겪은 미얀마 등 많은 나라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이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원조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한씨는 내달 5일부터 5개월간 남수단에서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년 만에 나가는 현장활동인 만큼 어느 때보다 가슴이 설렌다고 했다. 그는 “남수단 활동이 학계에 좋은 사례로 전달돼 정부가 훌륭한 정책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다시 현장 수혜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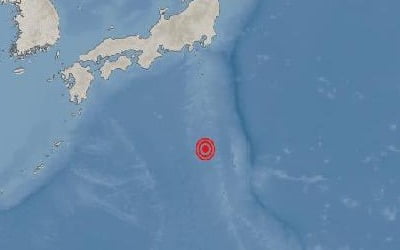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