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한쪽이 노비면 자식도 노비…'양반이 지배한 나라'의 비극
(21) 노비 애사
법으로 못박은 '일천즉천'
고려시대 10% 채 안된 노비 비중
조선시대 들어와 40% 넘게 늘어
세대 거듭할수록 노비 급증한 탓
가축이나 다름없었던 노비
생사여탈 전적으로 주인에 달려
노비가 주인 고소 땐 교수형
이름도 개똥·암캐 등으로 불려
유례없는 性 접대 세습
세종, 기생 세습하자는 건의 수용
기생의 딸도 기생되는 구조 생겨
'양반의 나라' 조선시대의 한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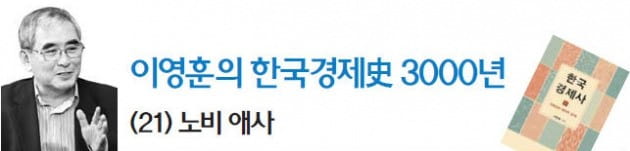
조선은 양반의 나라이자 노비의 나라였다. 조선왕조 500년은 노비의 애사(哀史)였다. 15세기 후반의 어느 사람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노비”라고 했다. 이는 다소간의 과장이다. 1606년 경상도 산음현 호적에서 노비는 전체 인구의 41%다. 1609년 경상도 울산부 호적에서는 47%다. 호적의 인구조사는 완전하지 않았다. 이 점을 고려해 역사가들은 17세기 초 노비의 인구 비중을 30~40%로 추정하고 있다. 15~16세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선 연재에서 지적한 대로 10~14세기 고려의 노비 비중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10% 미만이었다. 두어 사례에 의하면 5%를 넘기 힘들었다. 왕조 교체를 전후해 무슨 연유로 노비 인구가 그렇게나 팽창했던가. 한마디로 나라가 양반의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노비의 신분은 세습됐다. 세습의 원리는 부모 어느 한쪽이 노비면 그 자식은 죄다 노비가 되는 종천법(從賤法)이었다.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고도 했다. 이에 노(奴)가 양녀(良女)와 결혼하면, 또 비(婢)가 양부(良夫)와 결혼하면, 다음 세대의 노비 인구는 두 배가 된다. 그다음 세대는 네 배다. 이런 식으로 노비가 인구의 30~40%까지 많아졌다. 더 많아지지 않은 것은 상당수 노비가 도망쳤기 때문이다. 전체 노비의 대략 30%는 도망 중이었다.
고려는 노비와 양인의 결혼을 엄하게 단속했다. 이런 정책은 조선의 태종조까지 이어졌다. 태종은 노비와 양인의 부부를 강제로 이혼시켰다. 또 비와 양부의 자식을 양인 신분으로 돌리는 종부위량법(從父爲良法)을 시행했다. 아울러 노와 양녀의 자식을 관노비로 몰수하는 정책을 취했다.
노비 인구를 억제하려는 태종의 정책은 세종조에 이르러 허물어졌다. 세종은 양부와 비의 자식을 노비 신분으로 돌렸다(종모위천법·從母爲賤法). 이 법의 제정은 양인과 노비의 결혼을 사실상 허용한 것과 다를 바 없었다. 집안의 비를 주변의 양부와 결혼시키면 노비재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노와 양녀의 자식을 관노비로 몰수하는 법도 사실상 허물어졌는데,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단종조에서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세계 노예제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가장 비인간적인 신분 세습의 법이 성립했다.

1422년, 역시 세종조의 일이다. 노비는 주인을 고소할 수 없으며, 고소하면 교형(絞刑)에 처한다는 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이후 근 5세기를 뻗치는 노비 애사의 출발을 이뤘다.
노비는 그 생사여탈이 주인에게 장악된 노예로 전락했다. 주인의 가혹한 형벌로 대수롭지 않게 죽어간 노비들의 슬픈 이야기는 조선왕조가 남긴 사료에서 그 수를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노비는 주인의 재물로서 상속, 증여, 매매의 대상이었다. 노비의 가격은 666일어치 임금에 해당했다. 대개 말 1필의 가격이었다. 이는 고려가 정한 노비가격에 비해 5~6배나 높았다. 주인을 고소할 수 없다는 법 제정이 노비의 재산가치를 이렇게나 높였다.
이후 노비는 해방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말았다. 몸값이 666일어치고 연간 이자율이 40%나 하는 시대인데, 1년은 365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고려의 노비는 몸값이 100~120일어치 임금에 해당해 쉽게 해방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도 그리 천시되지 않았다. 그에 비해 조선의 노비는 주인의 재물로서 그 인격이 가축이나 물상의 수준으로 추락했다. 노비의 이름은 개똥, 말똥, 수캐, 암캐, 마당쇠, 바위 따위로 붙여졌다.

노비의 주인은 주로 양반 신분이었다. 양인도, 심지어 노비도 노비를 소유했는데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다. 15~16세기 중앙의 양반관료는 아무리 미관말직이라도 100명의 노비는 소유했다. 관직이 높아지면 수백 명쯤은 보통이었다. 현재 전하는 상속문서에서 가장 큰 노비 규모는 정3품 관직의 홍문관 부제학을 지낸 이맹현이란 사람인데, 758명에 달했다. 판서나 정승의 반열로 올라가면 1000명을 쉽게 넘겼다. 왕족이면 수천 명이었는데, 알려진 최대 규모는 세종의 제5왕자 광평대군과 제8왕자 영응대군이다. 왕조실록에 의하면 이 두 왕자의 노비는 각각 1만 명을 넘었다. 최대 소유자는 조선 국왕 자신이었다. 왕실의 재산을 관리하는 내수사에 속한 노비는 중종조에 수만 명에 달했다. 농촌 품관의 노비 규모를 살피면 물론 중앙의 양반관료보다 적었다. 그래도 지난 연재에서 소개한 대로 적어도 50명은 넘었으며, 많게는 300명에 달했다.
입역노비
노비의 존재 형태는 크게 두 가지였다. 예전에는 주인과의 주거 관계를 기준으로 솔거(率居)노비와 외거(外居)노비로 구분했다. 근래에는 주인에 대한 복무의 내용을 기준으로 입역(立役)노비와 납공(納貢)노비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역노비는 주인집 안팎의 가까운 곳에 살면서 주인의 지시에 따라 각종 노역에 종사하는, 쉽게 말해 주인에 의해 부림을 당하는 노비다. 종사한 노역은 청소, 세탁, 취사, 심부름 등의 가사노동에서부터 가작(家作), 작개(作介), 양잠, 직포 등 생산노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그 대가로 입역노비는 주인에게 의식주의 생활자료를 지급받았다. 그 점에서 세계사적으로 노예의 범주에 속하는 예속인이었다.
납공노비
납공노비는 주인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집, 가족, 토지를 보유한 소경리의 주체였다. 납공노비는 그의 토지에 왕조가 부과하는 조세와 공물을 납부했다. 그럼에도 그가 노비인 것은 그 몸이 주인의 재물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그는 국가가 일반 양인의 몸에 부과하는 구실, 곧 군역(軍役)에서 제외됐다. 그 대신 그는 주인에게 구실을 바쳐야 했는데, 신공(身貢)이라 했다. 신공의 양은 노라면 연간 면포 2필, 비라면 1.5필이었다. 물목은 반드시 면포가 아니라 납공노비의 처지에 따라 쌀, 콩, 물고기, 땔감 등으로 다양했다. 양인의 군역이 연간 면포 2필이므로 노의 신공 부담은 그와 별 차이가 없었다.
납공노비가 양인과 다른 점은 비의 신공이 강요됐다는 점이다. 양녀에게는 아무런 구실이 없었다. 18세기 영조 임금은 “여인의 공(貢)은 천하에 없다”고 했지만, 15~16세기의 노비제는 그렇지 않았다. 조선의 노비주는 여인의 몸에서도 공을 수취했다. 양반의 노비 규모가 수백 명이나 된 것은 납공노비가 그렇게 많았기 때문이다. 가까이 두고 부리는 입역노비는 대개 20~30명을 넘지 않았다. 나머지 다수의 노비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사는 납공노비였다. 앞서 소개한 이맹현의 경우 한성 안팎에 100여 명이 살고, 나머지 650여 명은 전국의 72개 군현에 거주한 납공노비의 무리였다.
기생
지방의 감영, 병영, 군현으로 가면 관비(官婢) 가운데 기생(妓生)이란 역을 진 여인들이 있었다. 기생은 관아의 연회에 나가 노래하고 춤추고 빈객의 침실에 들어 성 접대를 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한성에 올라와 교방(敎坊)에 속한 기생으로 복무했는데, 그 정원은 300명이었다. 관비 신분이므로 기생의 역은 기생의 딸에게 세습됐다. 기생의 아들은 관노가 됐다. 고려시대에도 기생은 있었다. 천한 역을 수행하는 간척(干尺)의 무리로 간주됐는데, 신분이 세습되지는 않았다.
관비의 일환으로서 기생이 생겨나는 것은 조선왕조에 들어서였다. 그 과정은 전술한 노비종천법이 생겨나는 과정과 동일했다. 세종은 기생이 모자라니 기생의 딸을 기생으로 삼자는 신하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나아가 세종은 북방을 지키느라 수고가 많은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 그 지역에 기생을 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 고을에 30~60명의 기생이 배치됐다. 기생의 역사는 중국 한(漢)의 무제(武帝)가 군사를 위로하기 위해 군영에 창기를 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렇지만 중국사에서 기생은 세습 신분이 아니라 직업여성이었다. 국가가 특정 부류의 여인에게 성 접대의 역을 세습시킨 사례는 세계사에서도 희귀하다. 여인의 몸에서 공을 수취한 조선 노비제의 한 단면이었다.
이영훈 < 前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오늘의 arte] 티켓 이벤트 : 윤한결의 한경아르떼필과 브람스 교향곡](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3687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