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은 준비 착착…'가상화폐 투기 우려'에 눈감고 귀닫은 정부

정부는 암호화폐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자칫 '긍정적 신호'로 해석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하지만 19일 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투기가 벌어질 수 있으니 중소기업을 육성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관련 법규나 규제가 없어 네이버·카카오 등 멀쩡한 기업들은 암호화폐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가고, 정작 스캠(사기)성 업체들은 국내의 무법지대에서 활개치도록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 해외는 대기업·제도권 위주로 산업 개편
국내 기업들은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 부정적 정책 기조에 괜히 눈 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다.
최근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체이스(JP모건)가 자체 암호화폐 'JPM 코인'을 발행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 일본도 미즈호은행, '일본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라쿠텐 등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사업 진행을 공개적으로 밝히며 경쟁에 뛰어들고있다.
이처럼 해외 대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사업을 전개한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사실상 해외에서만 사업을 진행중임에도 불구, 국내에서 언급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해외에서만 사업중이라고 해도 알려져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불법 여부를 확인하려 당국에 문의해도 암호화폐 관련 내용이 조금만 포함되면 손사래치는 분위기"라며 "정부 규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내에서 일절 암호화폐 관련 언급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귀띔했다.

대기업들마저 국내 암호화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은 국내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에 비해 어차피 불법에 가까운 일을 벌이는 사기성 업체들은 지금의 규제 공백 상황을 십분 활용한다. 이 역시 해외 상황과는 정반대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3월 이미 암호화폐 공개(ICO) 등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SEC와 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불법 업체들을 퇴출시키고 있다.
ICO하는 기업이 투자 위험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 등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ICO 중지,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고 사법 처리까지 받는 내용이 골자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마찬가지다. 뉴욕은 일정 수준 이상 자금동원력과 보안능력 등을 갖춘 거래소만 주 정부 인가를 받고 사업을 하도록 했다. 비교적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일본 금융청 역시 암호화폐 거래소 협회(JVCEA)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산업 건전성을 키우고 있다.
반면 국내에선 정부 시야에 들어온 대형 거래소들이 정부의 '규제 아닌 규제'의 표적이 됐다. 도리어 보안이나 인력 수준이 떨어지는 사실상 '사기성 장부거래'를 공공연하게 벌이는 중소 신규 거래소들은 지금도 정부 관심 밖에서 성업중이다. 피해자들이 적지 않지만 관련 법규가 없어 제대로 된 처벌도 받지 않는다.

업계는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퉈 움직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규제 정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1년 넘게 내고 있지만 정부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기존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부가 암호화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자체가 '긍정적 메시지'로 해석돼 투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업계는 암호화폐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부정적 선입견이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젠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은 "정부가 시장을 무시하거나 방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적절한 범주의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을 관리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산하 한경닷컴 기자 san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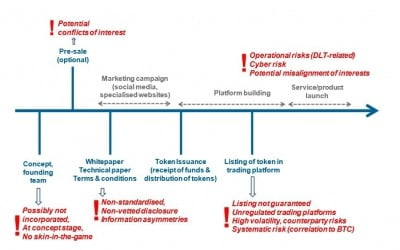
![[이슈+] 가상화폐 정책 손 놓겠다는 정부 '다시 원점'…"1년간 뭐했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ZA.18564339.3.jpg)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