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닮은 인공 장기로 신약개발 속도 높인다
이성준 팡세 대표
"3D 프린터로 오가노이드 제작
전임상 정확도 높이고 시간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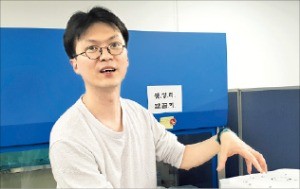
세포실험은 세포 차원에서 신약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단계다. 배양접시에 담긴 세포에 약물을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세포는 접시 표면에 2차원으로 배치된다. 세포끼리 평면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3차원인 실제 세포 구조와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약물 효과를 정확히 측정하기 힘들다. 동물실험은 동물에게 약물을 주입해 약효와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쥐 돼지 원숭이 등 포유류를 이용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2015년 7월 설립된 팡세는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오가노이드’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 오가노이드는 인체 세포를 자라게 해서 실제 장기와 흡사한 입체 구조물을 만든 것이다. 이 대표는 “오가노이드는 신약 개발 과정에서 약물의 효능과 안전성을 알아보는 데 최적의 실험체”라며 “전임상 시험의 신뢰도를 높이고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가노이드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게 바이오 3D 프린터와 바이오 잉크다. 팡세는 지난해 10월 기존 제품에 비해 오염 위험을 크게 낮춘 바이오 3D 프린터 ‘비타릭스’를 출시했다. 생체 친화적인 바이오 잉크도 개발했다. 바이오 잉크는 줄기세포, 하이드로젤, 성장인자(줄기세포가 특정 장기로 분화하도록 유도하는 생화학 물질)로 구성된다.
이 대표는 “오가노이드는 동일한 조건의 임상시험을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 미국처럼 오가노이드가 전임상 시험에 많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