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기자의 오거스타 도전기 ④·끝…'아멘 코너' 우즈처럼 울고 웃다
(4·끝) "아멘" 절로…'아멘 코너'
우즈가 인생 최악 샷 날린 12번홀
보란듯 그린에 올렸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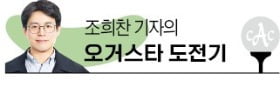
11번홀(파4·400야드) 티박스에 선 기자에게도 ‘멘탈 코치’가 필요했다. 직전 두 홀 연속 트리플 보기를 한 상태에서 ‘아멘 코너’(골퍼들의 입에서 ‘아멘’이란 탄식이 나온다는 11~13번홀)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2연속 트리플 보기 뒤 '아멘 코너'갑자기 모든게 어색해졌다. 연습한 것까지 치면 그동안 수만번 휘둘렀을텐데, 평소 드라이버를 잡을 때 손 모양이 아닌 것처럼 보였다. 티도 조금 낮게 꽂은 것 같고…. ‘가팔라진 호흡 탓이겠지’ 생각하며 숨을 깊게 들여마셨다. 빈 스윙을 하는 사이사이 활짝 핀 철쭉이 눈에 들어왔다.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나중에 찾아보니 철쭉은 오거스타내셔널GC을 상징하는 꽃이었단다.
멘털 붕괴되자 스윙도 흔들려
숲·웅덩이에 공 빠뜨려 '2벌타'
첫 더블 파…'아멘 코너' 실감
아멘 홀에서 우즈보다 6타 덜치다
11번홀의 전장은 400야드다. 아마추어 골퍼가 네 번만 홀에 공을 집어넣기엔 만만치 않은 거리다. 이럴 땐 어김없이 힘이 들어간다. 안 그래도 무너진 스윙 리듬에 힘까지 잔뜩 들어갔으니, 똑바로 갈 리가 없다. 결과는 페어웨이 왼쪽 러프. 공이 떨어진 곳에서 자세를 잡았다. 캐디 월터가 “오른쪽에 공간이 많다. 왼쪽으로 가면 죽는다”고 세번이나 말했다. 분명히 오른쪽을 봤는데, 또 다시 감겼다. 나무 숲 깊숙이 들어간 공은 찾을 수가 없었다.1벌타를 받고 네 번째 샷. 또 감길까 두려워 그린보다 오른쪽을 보고 쳤더니, 똑바로 날아가 그린 옆 웅덩이에 빠졌다. 30야드 드롭 존에서 칩샷 후 2퍼트. 첫 더블 파(+4타)였다. 11번홀이 올해 마스터스 토너먼트의 ‘핸디캡 1번’(520야드·평균 4.45타)이었다는 걸로 위안 삼았다.
다음은 ‘아멘 코너의 아멘홀’로 불리는 12번홀(파3·145야드). 티박스에 올라서니 “마스터스 챔피언은 12번홀이 점지해준다”는 말이 왜 나오는 지 알 수 있었다. 일단 모양이 흉악하다. 손바닥만한 땅콩 모양의 그린 앞에는 폭 2m가 넘는 ‘래의 개울’(Rae's Creek)이 흐른다. 길거나 왼쪽으로 감기면 벙커 또는 숲에 들어간다. 홀 주변에는 나무 벽이 만들어내는 돌개바람이 분다.
아멘 코너, 우즈처럼 울고 웃다‘12번홀의 저주’에 걸린 골퍼는 셀 수 없을 정도다. 2011년 마스터스 대회 마지막날 4타차 선두를 달리던 로리 매킬로이는 이 홀에서 더블 보기를 적어낸 뒤 무너졌다. 2016년 대회 마지막 날 5타 차 선두였던 조던 스피스를 끌어내린 홀도 이 곳이었다. 물과 벙커를 오간 끝에 쿼드러플 보기(+4)로 마무리한 스피스는 이후 상당기간 슬럼프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12번홀 온 그린…"엄청난 샷" 환호
13번홀선 '래의 개울' 탓에 좌절
아멘 코너 3개 홀에서만 7타 잃어
타이거 우즈는 12번 홀에서 웃고 울었다. 2019년에는 선두경쟁을 벌였던 프란체스코 몰리나리가 이 홀에서 더블보기를 한 덕분에 우승컵을 들었지만, 이듬해엔 우즈 인생의 최악 스코어인 ‘셉튜플 보기’(+7)를 적어냈다.
“바람 방향을 보니 152야드 정도 치는 게 좋겠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운데 보고 쳐” 월터가 6번 아이언을 꺼냈다. 군말 없이 휘둘렀다. 적당한 탄도로 뜬 공은 핀 왼쪽 7m에 뚝 떨어지더니 그대로 멈췄다. 기자를 뺀 동반자와 캐디 7명이 일제히 두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엄청난 샷이야!(What a shot!)”
그린 위에 올라간 공은 딱 하나 뿐이었다. 마틴 립튼 더선 기자는 공을 물에 빠뜨렸고, 그렉 쉐이머스 게티이미지 기자의 공은 그린 뒤 벙커에 들어갔다. 윌 그레이브스 AP통신 기자는 티샷이 네 번 연속 물에 빠지자, 자신도 물에 빠지려는 포즈를 취했다.
동반자들을 향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개울 위에 놓인 ‘벤 호건 브리지’를 건넜다. 오거스타GC가 교통사고를 딛고 마스터스에서 2회 우승한 벤 호건에게 헌정한 바로 그 다리다. 오거스타GC에서 맞는 첫 버디 퍼트는 악몽이었다. 너무 살살 친 탓에 겨우 3m 구르고 멈춘 것. 버디는 그렇게 보기가 됐다.

마스터스의 마지막 시험은 ‘체력 테스트’
13번홀(파5·455야드)은 앞선 두홀에서 상처받은 선수들이 위로받는 홀이다. 하지만 이 홀을 아멘 코너에 넣은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린 앞을 전세 낸 ‘래의 개울’ 때문이다. 골퍼 앞에 놓인 선택지는 두가지다. 긴 채를 들고 2온을 노리느냐, 개울 앞까지 끊어간 뒤 3온을 시도하느냐.510야드로 세팅된 프로 선수들도 드라이버 거리와 공격 성향에 따라 둘 중 하나를 택한다. 2010년 마스터스 우승컵을 가져간 필 미컬슨은 마지막날 207야드를 남긴 상황에서 2온을 시도해 버디를 잡았다. 반면 마스터스 2회(1994, 1999년) 우승자인 호세 올라자발은 올해 2라운드에서 3온, 1퍼트로 버디를 낚았다.
이런 고민은 티샷을 멀찍이 날리는 장타자나 할 일이다. 기자의 티샷은 또 다시 왼쪽으로 감기더니 실개천에 빠졌다. 1벌타를 받고 3번 우드로 친 세번째 샷은 그린 근처 개울 앞에 떨어졌다. 4온에 3퍼트. 더블 보기였다. 아멘코너 3개 홀에서 7타를 잃었다. 그 전 10개 홀의 성적표(+14타)를 감안하면 아멘코너가 어렵긴 어려웠던 모양이다.

트리플 보기 또 보기…'체력 방전'벙커 하나 없는 쉬운 홀(14번홀·파4·380야드)에서 트리플 보기를 한 이유도, 올해 대회 때 스튜어트 싱크가 홀인원을 한 16번홀(파3·145야드)에서 3타를 헌납한 원인도 날씨와 지형, 신발에 돌렸다.
14~16번홀 계속된 보기에
'설상가상' 가파른 17·18번홀 만나
체력싸움도 완패…최종 104타
이제 남은 건 2개 홀. 오거스타GC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가파른 오르막길이다. 다리가 성치 않은 우즈가 이런 험한 코스를 4일 내내 걸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다. 선수들이 4일 동안 걷는 거리는 대략 30㎞에 이른다고 한다. ‘마스터스의 주인이 되려면 마지막 관문인 체력 테스트를 넘어야 한다’는 걸 절감했다. 마지막 두 홀은 ‘될대로 되라’는 식으로 쳤고 모두 더블보기로 마무리했다.
최종스코어는 104타(전반 47, 후반 57). 2등과 10타 이상 차이나는 완벽한 1위였다. 월터는 “아주 잘 쳤다. 오거스타 첫 출전에 100타를 깨는 아마추어는 많지않다”고 했다. 동반자들은 진이 빠져서인지, 자신들의 스코어에 실망해서인지, 별다른 축하인사 없이 “즐거웠다”고만 했다.

내년에 또 오거스타GC에 올 수 있을까. 또 당첨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내년에 다시 한번 ‘월요일 골프 로또 당첨자’가 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회사에는 알리지 않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했다. 이렇게 ‘1억원짜리 골프 체험’은 끝났다. 이제 데스크(부장)가 내준 숙제를 해야 할 차례다.
'전담 캐디' 월터 굿윈은
20대 1 경쟁률 뚫은 20년 베테랑 캐디
조희찬 기자의 골프백을 멘 월터 굿윈(72)은 오거스타내셔널GC에서만 12년을 일한 베테랑 캐디다. 오거스타GC를 찾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라운드를 도왔고, 2018년 마스터스 챔피언인 패트릭 리드가 오거스타GC에 놀러올 때 찾는 ‘지명 캐디’이기도 하다.오거스타GC는 캐디 선발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굿윈은 “대다수 동료가 10년 이상 골프 관련 경력을 가진 채 들어왔다”고 했다. 그 역시 이곳에 오기 전에 20년 동안 캐디 및 골프장 관리인 등으로 일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면 확실한 대우를 받는다. 미국 채용정보 사이트 ‘컴패러블리’에 따르면 오거스타GC 캐디들은 급여로만 최대 6만달러를 받는다. 손님들이 비공식적으로 찔러주는 팁은 별도다. 기자는 캐디 역할은 물론 수없이 많은 사진을 찍어준 그에게 200달러를 건넸다. 기자가 “(100달러에 얼굴이 그려져 있는 미국 전 대통령) 벤저민 프랭클린 두 장”이라고 하자 “두둑하네. 고맙다”고 했다. 팁이 많다고 놀라는 눈치는 아니었다.
오거스타GC 캐디들이 받는 팁은 수십달러부터 수백달러까지 천차만별이라고 한다. 공식적으로는 팁을 안 받는다고 한다. 골프장 곳곳에 카메라가 숨어 있어 캐디가 골퍼들에게 팁 받을 ‘타이밍’을 알려준다는 얘기도 했다. 캐디들은 오거스타GC가 정비를 위해 문을 닫는 5~10월에는 다른 골프장에서 일해도 된다. 이 기간에 벌어들이는 수익을 감안하면 오거스타GC 캐디의 연봉은 1억원을 훌쩍 넘는다.
특전도 있다. 1년에 한 번 오거스타GC에서 라운드할 수 있다. 다만 일정은 골프장이 ‘통보’한다. 날짜는 바꿀 수 없다.
오거스타GC를 찾는 골퍼들은 1인 1캐디를 배정받는다. 지명하지 않으면 골프장이 배정한다. 한국과 달리 현장에서 현금으로 캐디피를 주는 시스템이 아니다. 캐디피와 그린피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오거스타GC 회원만 결제할 수 있다.
오거스타GC 캐디들은 흰옷만 입는다. 개장 첫해인 1933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주로 캐디를 했는데, 설립자들은 이들이 흰옷을 입어 조금이나마 ‘똑똑해 보이길 원했다고 한다.
5%의 사나이 조희찬은
평균타수 90…비거리는 200m
전 세계 기자 500명 중 28명만이 당첨. 5% 확률의 라운드 기회를 얻은 조희찬은 11년차 아마추어 골퍼이자 8년차 골프 기자다. 박인비, 리키 파울러와 같은 1988년생이다. 로리 매킬로이보다 한 살 형이다. 키 182㎝, 몸무게 100㎏으로 임성재(183㎝, 90㎏)보다 조금 더 무겁다. 평균 비거리는 200m. 핸디캡은 +18로 ‘보기 플레이어’다. 라이프 베스트는 81타. 오거스타GC 라운드 기회를 얻기 전까지 가장 좋은 ‘뽑기’ 성적은 로또 4등(5만원)이었다. 골프 기자로서의 목표는 두 가지다. 타이거 우즈 단독 인터뷰와 30년 뒤에도 골프 기자를 하는 것이다.▶ (1회) 꿈의 오거스타 라운드…로또에 당첨되다
▶ (2회) 우즈도 떤 '유리알 그린' 실감…이게 실화냐
▶ (3회) 지옥 같은 '헬(hell)렐루야'…악명 높은 오거스타 '바람의 심술'
오거스타(미국 조지아주)=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