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CFO Insight] 북쉘프=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
말더듬증 소년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한경 CFO Insight] 북쉘프=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81852.1.jpg)
아들을 차에 태우고 학교에 간 그녀는 교장 수녀님과의 면담 자리에서 아들을 가르쳤던 수녀님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다. 교장실로 들어온 수녀에게 그녀는 말을 더듬는 자신의 아들이 책을 제대로 읽지 못하자 “부-부-부-부-바이든”이라고 말하며 놀린 게 맞느냐고 묻는다.
‘문제를 짚어주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변명을 들은 그녀는 수녀에게 “또 한 번 내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며 그땐 다시 와서 그 모자를 머리에서 벗겨내 갈가리 찢어버리겠어요. 알아듣겠어요?”라고 외친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조에게 다시 교실로 들어가 수업을 들으라 말한다. 집안 대대로 독실한 가톨릭 교도인 어머니가 수녀님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는 건 그에게 반세기가 지나도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거물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주고, 보다 더 큰 꿈에 도전할 수 있게 응원해준 든든한 지원자가 있다는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어머니가 그랬다.
고등학생 무렵까지 심한 말더듬증에 시달렸던 바이든에게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조이, 넌 아이큐가 정말 높아, 넌 정말 할 말이 많구나. 아가야, 너의 뇌가 너를 앞지르는 거야. 다른 애들이 놀린다면 그건 그 애들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를 샘내는 거라고.” 어머니는 이렇게 아들이 항상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도왔다.
어머니와 가족들의 응원 덕분에 바이든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말더듬증을 이겨낼 수 있었다. 매일 홀로 거울 앞에 서서 큰 목소리로 미국의 시인 예이츠와 에머슨의 긴 문장들을 읽어나간 덕분에 말더듬증을 고치는 건 물론 훗날 정치인으로 필요한 연설 능력도 키울 수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동차 대리점에서 일하던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네 아이를 키우는 빠듯한 살림을 꾸려나가면서도 자녀들에게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고 가르쳤다. 신발이 뜯어져 물이 샜지만 돈이 없어 새 신발을 사주지 못하고 신발 밑에 판지를 깔아 신게 했을 때도 어머니는 결코 당황하는 법이 없었다고 바이든은 회상한다.
'조 바이든, 지켜야 할 약속'은 그가 2007년 출간한 자서전이다. 그는 이때 2008년 대선에 도전하려 했지만 당내 경선에서 밀려 꿈을 이루지 못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러닝메이트로 지명돼 8년간 부통령직을 수행한다.
바이든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를 전형적인 워싱턴의 주류 정치인으로 생각한다. 변호사로 일하다 29세에 상원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36년간 계속해서 상원의원으로 일하다 8년간의 부통령직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그의 이력만 놓고 보면 그를 부유층 출신의 엘리트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는 오해다.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스스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 변호사 직업을 택한 것도 고등학교 시절 의회 인명록을 뒤져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치권에 입성한 사람 대부분은 변호사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정치인)의 개인적 역사를 훑어보다가 그들 중 많은 사람이 부유하고 안정된 가정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충격받았다.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에 진출한 사람들은 거의 변호사였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로 진로를 정했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이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자세하게 설명한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그의 첫 아내 닐리아와 어떻게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함께 어떤 꿈을 꿔갔는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내와 딸을 잃게 된 자신이 어떻게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두 번째 부인 질 바이든과는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등 그의 개인적 삶이 세세하게 담겨있다.
앞으로 4년간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이끌어갈 남자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읽어보길 추천한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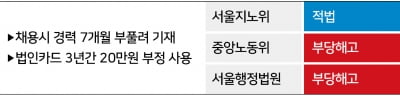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