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저는 하얗게 된 얼굴로 새벽부터 밤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아이들을 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너는 자라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 오래오래 이 문장 속에 머물렀다. 서른의 수인은 이십 대 때 알고 지냈던 언니에게 긴 편지를 쓴다. 열심히 살았지만 이상과는 점점 멀어진 자리에 어둡게 내려앉은 고달픈 현실이 그녀가 당도한 서른이었다. 선배의 말에 속아 다단계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열심히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올바르고 아름답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말’을 믿고 불나방처럼 제 무덤을 향해 날아갔다. 사랑했던 사람이 끌어들인 그 자리에 또 다른 사랑했던 사람을 끌어당겨야 살아남는 그곳에서 수인은 자신을 따랐던 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만다. 특별할 것 같았던 20대가 저물고 평범한 삶을 갈망했지만 그 언저리에 아슬아슬하게 닿는 것마저도 여의치 않음을 뼈아프게 자각한 수인의 편지는 나의 스물, 그리고 내가 지나온 서른과도 겹쳐졌다. 이 문장에서 오래 머문 이유였는지 모른다.
‘꽃다운 스물’이란 표현답게 나의 스물은 찬란했다. 원하던 대학은 아니었지만(사실 별생각이 없었다) 입시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서 행복했다. 전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부와는 담을 쌓은 채 여한 없이 놀았던 대학생활도 나쁘지 않았다. 졸업 후 잠시 막막했지만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 미련을 핑계 삼아 취업 대신 대학원을 선택했고 뒤늦게 연애도 했다. 누군가가 온전히 나를 바라봐 주는 느낌이 싫지 않아 동기들 보다 조금 이른 결혼을 했고 첫아이가 태어났다. 내 이십 대의 기록이다.
서른은 좀 힘들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지내는 시간은 힘겨웠고 ‘엄마’라는 렌즈로만 바라본 세상은 온통 회색빛이었다. 아이가 커 가는 동안 나날이 저물어간다고 느낄 만큼.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아이들을 거의 방치한 채 새벽까지 공부했고 늦은 나이에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또 그만큼의 힘겨운 나날들이 이어졌고 어느 날 눈 떠 보니 내 청춘은 그렇게 가 버렸다. ‘되고 싶었던 나’ 대신 ‘되는 대로 나’가 되어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이십 대에는 내가 뭘 하든 그게 다 과정인 것 같았는데, 이제는 모든 게 결과일 따름인 듯해 초조하네요”
모든 게 과정이고 경험이니 실수도, 실패에도 한없이 너그러웠던 이삼십 대를 지나오니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어느새 작은 결정 하나에도 주저하는 소심하고 겁에 질린 쓸쓸한 중년이 되었다. 소설가 김훈의 말처럼 ‘내일이 새로울 수 없으리라는 확실한 예감에 사로잡히는 중년‘ 이 되어 난감함과 불안이 교차하는 길목에 서 있었다. 탄탄대로일 것만 같던 삶의 도로는 곳곳에 숨어 있는 돌부리에 시시때때로 발이 걸려 넘어졌고 진창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날도 많았다. 세월이 앗아간 것들이 억울했고 한때 경멸했던 시시한 어른이 된 것 같아 자주 불안하고 숨이 찼다.
수인의 편지는 속죄를 위한 힘겨운 발걸음이었다. 소설은 절망 속에서도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부여잡은 채 어두운 터널을 뚫고 나갈 수인을 응원했다. 마치 나를 응원하듯, 우리 모두의 삶을 응원하듯 소설 속 문장은 잔잔하게 마음을 울렸다.
책을 읽으며 나도 모르게 위로받는 날이면 언저리에서 맴돌기만 하던 삶의 시곗바늘이 제 자리를 찾아 다시금 목적지를 향해 째깍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다.
‘너는 자라 겨우 내가 되겠지… 겨우 내가 되겠지’ 수인의 목소리 흔적에 내 마음의 소리를 가만히 실어 본다.
‘너는 자라 마침내 내가 되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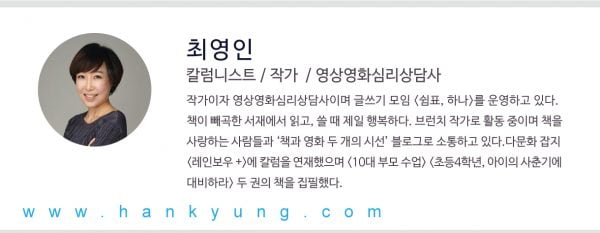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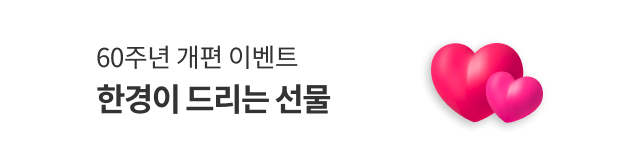


!['킬러 문항' 빠진 국·영·수 쉬웠다…"올해 수능 가장 큰 변수는?" [중림동사진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411/01.38655379.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