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美공화당…트럼프發 '내전'에 상하원 선거도 위기
투표율 하락·경합주 패배 '우려'
미국 공화당이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를 둘러싼 분열로 '내전' 상황에 빠지면서 대선은 물론 이와 동시에 치러지는 상·하원 선거에서도 위기를 맞고 있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가 자당에 맞선 싸움의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정치지도를 찢어 열고 있다"며 이는 "전국의 공화당원들을 자기 파괴적인 불화로 몰아넣어 다수 의원들을 위태롭게 하고 보수 성향의 주(州)들을 힐러리 클린턴의 측으로 던져버리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7일 트럼프의 2005년의 '음담패설 녹음파일'을 보도해 파문이 확산한 뒤 폴 라이언 하원의장과 30여 명의 공화당 인사들이 사실상 지지를 철회하거나 후보사퇴를 압박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는 경쟁자인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의 지지율 격차가 두자릿 수로 벌어지자 11일(현지시간) 자신을 버린 라이언 의장과 공화당 인사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트윗을 쏟아내며 사실상 아군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트럼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폭스뉴스에 공화당 지도부가 "지지하지 않는 데 진절머리가 난다", 라이언 의장의 "지지를 원하지도, 신경쓰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등 자당을 향한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화당 지도부에 대한 트럼프의 이 같은 비난과 조롱이 계속되면 상하원 선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의 사기를 꺾어 투표율을 저조하게 하거나 트럼프의 열성적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버린 의원들에게 투표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
특히 상하원 선거 경쟁이 치열한 경합주에 출마하는 의원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들은 당 지지층과 거리를 두거나 주류 유권자 대부분이 거부감을 가진 트럼프를 지지해야 하는 쉽지 않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서도 통상 공화당을 지지하지만, 트럼프는 견딜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중도 우파와 대졸 이상 유권자 표심 이탈이 공화당 후보들의 가장 큰 우려다.
이들은 선거 때 공화당 지지자의 4분의 1에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공화당 전략가 조시 홈스는 "이들 유권자는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를 위해 투표하러 가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이들이 아예 투표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재앙적"이라고 말했다.
'악몽'에 가까운 가능성은 경합주 유권자들이 트럼프 때문에 공화당을 응징하는 경우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은 투표장에 나가지 않고,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에게만 표를 던진 뒤 상하원 선거에는 투표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상원선거에서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곳은 민주당이 승리하고, 공화당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미주리와 애리조나, 캔자스는 상하원 선거에서 경합주로 바뀔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 당내에는 트럼프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트럼프는 대부분 소액 후원자들의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후원자들은 그에게 영향력이 거의 없다.
70세인 트럼프는 이번 대선 이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공화당은 이번 분란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할 통일된 전략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단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기다려본 뒤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이 같은 분란을 대선뿐 아니라 상하의원 선거에도 유리하게 활용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클린턴 캠프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된 주 가운데 조지아와 애리조나 등 적어도 두 곳은 승리를 노려볼 만한 현실적 목표물이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공화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트럼프는 조지아에서 패배할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NYT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세를 몰아 상하원 선거에 투입하는 전력을 높이는 분위기다.
클린턴을 지지하는 슈퍼팩(정치활동위원회) '미국을 위한 최우선행동'(Priorities USA)이 일부 자금을 상원 선거에 돌릴 수도 있으며, 이르면 내주께 이를 위한 선거광고 방송을 시작할 수도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kje@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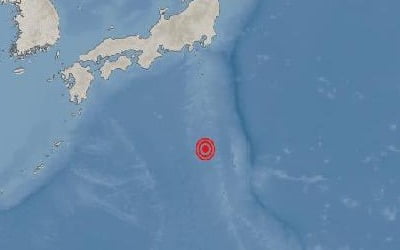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