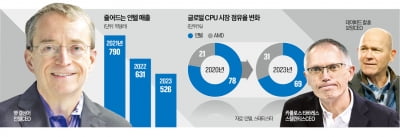해·달 등 자연 구성요소 단순화…세련된 구성에 색감도 '은은'
동·서 미술 화합 가능성 제시
수화(樹話) 김환기(1913~74)가 3년 만에 피난처인 부산에서 서울 성북동 자택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망연자실했다. 오랫동안 모아 온 백자 달 항아리들이 모두 깨져버렸기 때문이었다. 정원은 거대한 자기편의 무덤이 됐다.
마치 조선시대 도요지에 온 것처럼 산산조각난 자기편들은 무너진 왕조의 아스라한 옛 영화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러나 충격도 잠시. 김환기는 그 도자기의 잔해 속에서 되레 묘한 쾌감을 느꼈다. 그 야릇한 감정은 오랫동안 지속돼온 도자기에 대한 병적인 집착의 사슬을 전쟁이라는 뜻하지 않은 사건이 대신 통쾌하게 끊어준 데서 오는 것이었다.
김환기의 달 항아리에 대한 사랑은 유별났다. 골동품상을 기웃거릴 때마다 하나씩 들고 온 게 어느새 마당을 가득 메웠고 나중에는 거실과 방안까지 침범할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의 달 항아리에 대한 집착은 해방 후 신사실파 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됐다.
그것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전란 이후의 서구화 및 산업화의 물결 속에 퇴색되고 전설이 돼버린 선조들의 자연 친화적인 삶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의 감정이 뒤섞인 것이었다. 그런 자각은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와 자연에 대한 탐색 욕구를 자극했고 1950년대 들어와 한국적 소재를 반복적으로 그린 배경이 됐다.
그가 즐겨 그린 소재는 백자, 청자와 같은 인공적 기물과 해와 달, 강과 산, 구름, 새, 나무 등 자연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들이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이 두 소재는 윤난지 이화여대 교수의 지적대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기적 합일체로 존재했다. 그런 생각은 “둥근 하늘과 둥근 항아리와/푸른 하늘과 흰 항아리와/틀림없는 한 쌍이다(‘이조항아리’,1976)”라고 한 그의 시구에 잘 드러난다. 그는 희고 둥근 달 항아리의 색과 조형 속에서 우리의 자연을 읽었던 것이다.
그의 작가로서의 독창성은 이런 자연친화적 소재들을 서구 현대미술(모더니즘)의 원리 속에 녹여 넣었다는 점에 있다.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3년간의 파리 체류(1956~59)였다. 그는 세계미술 중심부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한국적 추상이라는 제3의 길로 나아갔다. 1957년 작인 ‘영원의 노래’는 김환기의 그러한 동서 절충적 추상양식의 모색과정을 잘 보여주는 작품 중 하나다.
구성 방식은 언뜻 보기에 입체파 등 반(半)추상에서 완전추상으로 이어지는 서구 현대미술을 연상시키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국적인 소재들이 군데군데 똬리를 틀고 있다. 추상이라는 서구의 형식적 틀 속에 산, 구름, 사슴, 매화, 항아리 같은 구상적 소재들이 곳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특정한 대상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한국의 전통적 관념을 형상화한 일종의 문화적 아이콘에 가깝다. 그 중 상단의 S자형 산세와 사슴은 고구려 고분벽화인 무용총 수렵도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세모, 타원, 동심원 등으로 단순화된 부호들은 조화롭게 모여 한국적 자연이라는 총체를 이루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이 모든 소재들이 음양오행의 원리 아래 배열돼 있다는 점이다. 푸른색 바탕 위에 표현된 이미지들은 오행(五行)설에서 다섯 방향을 상징하는 오방색(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이 주조를 이루고 있고 특히 산을 단순화시킨 푸른색 세모를 동쪽에, 검은색 세모를 북쪽에 배치한 것은 작가가 방위가 결합된 전통색의 원리를 의식적으로 사용했음을 암시한다. 또 화면 아래쪽 좌우의 흰색과 검은색의 타원, 오른쪽 상단의 둥근 달과 왼쪽 하단의 달 항아리처럼 한 쌍을 이루는 동일 형태의 모티프를 대칭적 위치에 배치한 사실로부터 작가가 음양의 조화를 염두에 뒀음도 함께 읽어낼 수 있다.
기법 면에서도 화가는 몬드리안의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차가운 기하학적 선을 거부하고 굵기가 일정치 않은 동양화의 우연적인 선을 사용함으로써 서구 모더니즘 미술과는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겉보기에는 서구적 세련미를 풍기지만 그림이 껴안고 있는 의미는 지극히 한국적이고 동아시아적인 것이다.
기세등등한 서구의 추상미술은 수화의 그림 속에서 그렇게 고분고분히 자신을 낮추며 동양적 자연의 일부가 됐다. 한국적 문화적 정체성과 서정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세련미에 도달할 수 있는 해법을 수화는 일찌감치 우리에게 값진 유산으로 남긴 것이다. 수화가 그처럼 애지중지하며 보듬던 달 항아리가 그에게 자연 그 자체였던 것처럼 이제 수화의 그림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자연이 됐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한국의 자연이 부르는 ‘영원의 노래’를 듣는다.
명화와 함께 듣는 명곡 - 비에냐프스키의 '전설'
“깡깡이나 키는 녀석에게 내 딸을 줄 수는 없어.” 폴란드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헨리크 비에냐프스키(1835~80)는 애인의 아버지를 찾아가 결혼승낙을 받으려다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이사벨라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8살에 파리음악원에 입학할 정도로 총명했던 작곡가는 묘수를 짜냈다. 그것은 멋진 음악을 작곡해 감동시키는 것이었다.
자 그런데 어떤 음악이라야 노신사를 감동시킬 수 있을까. 젊음은 내일을 생각하지만 노인은 과거에 집착하기 마련. 답은 분명했다. 바로 노인의 회고 취미와 우수를 자극하는 일이었다. 그를 대표하는 바이올린 소품 ‘전설’은 그렇게 탄생했다. 그는 이사벨라의 부모를 초대, 읍소하는 대신 자신이 새로 작곡한 음악을 연주했다. 노부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가 이사벨라를 얻었음은 물론이다.
흘러간 중세시대의 영화를 회고하는 듯한 이 음악은 애조 띤 멜로디가 짙은 낭만적 향수를 불러일으킨다. 과거라는 시간을 불러내는 것 같은 호른의 도입부에 이어 애조 띤 바이올린이 이어지는데 마치 중세의 고성에서 상념에 잠긴 아름다운 공주의 자태를 보는 것 같다. 중간부로 들어서면 용맹한 기사들의 무용담을 듣는 듯 밝고 활달한 멜로디가 전개되고 종반부에는 다시 처음의 호른 연주가 시간이 현실로 되돌아감을 알려 줘 듣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느끼게 만든다. 사라져가는 옛 문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김환기의 ‘영원의 노래’는 그런 점에서 이 음악과 절묘하게 어울린다.
정석범 <문화전문기자ㆍ미술사학 박사 sukbum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