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영국' .. 내용 우리와 비슷...방향은 딴판
개입 등으로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때마침 지구 저쪽 영국에서도 금융제도 개편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영국은 금융개혁을 위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 편집자주 >
========================================================================
영국의 금융개혁 조치는 한국에서 진행중인 금융개혁방향과 흡사하다.
영국의 개혁흐름은 통화신용정책 권한을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에 부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감독기능의 일원화 <>영란은행의 은행감독권 박탈
<>중앙은행의 물가목표 책임제 시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당정부의 금융개혁 제1탄은 집권한지 불과 1주일도 안돼 터져 나왔다.
영란은행에 통화신용정책의 독립성을 부여한다는 조치였다.
이 때만해도 런던금융시장은 "당연한 것"이라며 환영 일색이었다.
상황은 1주일만에 바뀌고 말았다.
고든 브라운재무장관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을 재무성 산하의
증권감독위원회(SIB)로 통.폐합하는 조치를 단행한데 이어 지난달 21일에는
영란은행의 은행감독기능을 박탈, SIB로 이관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금융감독체계의 일원화는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였다.
지금까지의 금융산업 감독구조는 은행 증권 투자은행등 각 금융산업별
"자율규제기구"를 기반으로은행은 영란은행, 보험은 상무부(DTI), 기타
금융권은 재무부산하의 SIB가 관장하는 3층구조여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무부가 은행감독권을 분리시킴으로써 영란은행에 가한 직격탄은
전혀 예상밖의 개혁방안이었다.
노동당정부는 한술 더떠 지난 12일에는 "중앙은행이 물가목표선을 지키지
못할 경우 그 사유서(?)를 재무부에 제출토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질 인플레이션율이 정부가 정한 목표치(현재는 2.5%)와 비교해 위 아래로
1%포인트 벗어날 경우 영란은행총재는 그 사유와 아울러 대처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재무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한국의 금융개혁방안처럼 중앙은행총재가 물가목표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임시킨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는 않다.
금융개혁 추진방안만 놓고 보면 우리와 영국의 사례는 너무나 유사하다.
그렇다고 금융개혁조치에 따른 효과가 똑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10여년전에는 금융빅뱅을 단행함으로써 금융부문에 관한한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번 금융개혁작업은 칼날을 더 갈기 위한 후속조치일 뿐이다.
배경도 사뭇 다르다.
우리의 경우 개혁방안을 둘러싸고 재경원과 한은간의 "밥그릇 싸움" 양상이
농후한 것도 사실이다.
노동당정권이 새삼스레 금융감독권한을 움켜쥐려고 하는 이유는 EU통합과
관련이 있다.
내년에 유럽중앙은행이 창설되면 영란은행은 지역은행(local bank)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다.
가만히 앉아서 당하느니 아예 이번 기회에 금융정책기능을 정부로 끌어
들이자는게 노동당정부의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개혁방안을 놓고 우리처럼 금융계 전체가 시끌벅적한 것도 아니다.
"금융비즈니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로선 새로운 차원의 규제방안을 마련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재무장관의 말 한마디로 그만이다.
정부 개혁방안의 최종목표는 소비자금융을 중시하고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다.
< 런던=이성구 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6월 19일자).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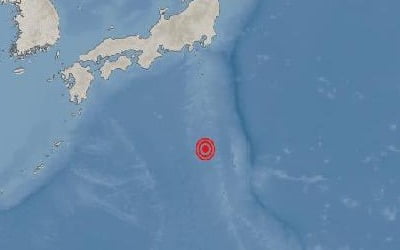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