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산다는 건] 냉탕·온탕 오가는 '외로운 떠돌이', 북미라인 득세…'차이나스쿨'은 찬밥
박근혜 정부들어 친중라인 떴지만 젊은 외교관들 여전히 기피
다른 부처선 '공공의 적' 취급…"출장 온 VIP 의전에만 신경"
영어 못한다고 대놓고 무시도

◆겉은 화려하지만…
동포, 여행객을 비롯한 재외국민 보호는 외교관의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업무다. 주이스탄불 한국총영사관 C영사는 작년 7월15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하다. 터키 아타튀르크 국제공항이 쿠데타 여파로 폐쇄되면서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승객들이 모두 고립된 상태였다. C영사는 쿠데타 세력과 경찰 사이의 총격전을 뚫고 승객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새우며 상황을 수습했다. 그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관련 사건 사고만 매일 30건이 넘는다”며 “영사 업무를 맡은 외교관들은 언제든 현장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극심한 긴장과 피로를 느낀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근무가 독으로 변하는 때도 있다. 올해 재외공관에서 성추문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5건이었다. 최근 몇 년간 1년에 한두 건 정도 일어났던 것에 비하면 급증한 셈이다. 최근에는 칠레 주재 영사가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 조치를 당한 데 이어 중동 지역의 한 현직 대사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차이나스쿨’ 여전히 ‘찬밥’
외교부 내 핵심 엘리트 그룹은 이른바 ‘서울대·북미라인’이다. 미국 주재 공관이나 외교부 북미국·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에서 커리어를 쌓은 외교관을 북미라인으로 분류한다. 반기문 전 장관 이후 장관들은 모두 서울대 출신, 북미국 및 재미공관,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력을 지니고 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친중(親中) 외교로 정권 실세들이 주중 대사로 잇따라 나갔지만 ‘차이나스쿨’은 북미라인에 비해선 여전히 ‘찬밥’ 신세다. 중국 기피 현상은 젊은 외교관들 사이에서 심하다. 외무고시 출신 한 사무관은 “베이징대사관 근무는 미국, 일본, 유엔본부, 제네바, 벨기에, 오스트리아와 더불어 ‘가-1’로 분류되는 핵심 지역이지만 생활 여건이 열악해 정작 인기는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다른 외교부 관계자는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참사관급 사이에선 중국 근무 경쟁이 치열하다”며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부터 중국 정무공사를 지낸 대표적 중국통”이라고 설명했다.
◆타부처엔 ‘공공의 적’
전직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A씨는 현직 관료 시절 틈만 나면 외무공무원 욕을 했다. A씨는 국제금융 쪽 일을 많이 해 외교관들과 접촉할 기회가 잦았다. 그는 “외교관들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공복이 아니라 일신상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해외공관에 나간 외교관들이 국가를 대표해 일하기보다는 국내에서 출장 나오는 ‘VIP’ 의전에만 신경쓰고, 국내 동향에 안테나를 세우느라 바쁘다는 비판이었다.
A씨는 해외공관 예산을 깎는 일에도 앞장섰다. 하지만 매번 국회에서 반대해 무산됐다고 투덜댔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대접을 받아본 국회의원들이 예산 깎는 일에 결코 동의할 리가 만무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외무공무원은 이처럼 공직사회 내에서도 ‘공공의 적’으로 여겨진다. 각 부처에서 공관에 파견돼 일해본 공무원들은 하나같이 외교부 공무원의 ‘갑(甲)질’에 분통을 터뜨린다.
해외 공관 근무 경험이 있는 경제부처 B국장은 “영어를 못한다고 대놓고 무시하거나 심지어 업무추진비도 차별 지급한다”며 “재외공관 파견 공무원들은 외교관들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러 간 건데 볼멘소리라도 하면 원소속 부처에서 예산을 타오면 되지 않느냐고 타박한다”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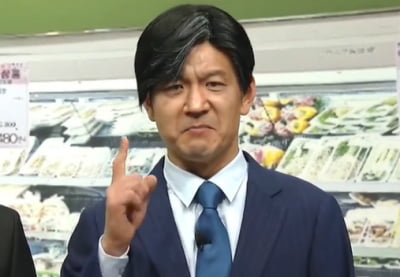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