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트렌드] 열정은 젊은이 못잖은 노인들…"인터넷·카톡 자유롭게 쓰고 싶다"
'디지털 소외' 노인, 스마트폰에서 '2차 소외'
<3> 소통하고 싶은 노인들
노인 93% "향후 스마트폰 구입 의사"
메신저로 자녀들과 살갑게 소통 원해
![[IT 트렌드] 열정은 젊은이 못잖은 노인들…"인터넷·카톡 자유롭게 쓰고 싶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503/AA.9703616.1.jpg)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걸고 받을 때도 실수가 잦다. 처음엔 터치를 잘못해 엉뚱한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 이후 차라리 기억하고 있는 번호는 일일이 눌러 통화했다. “왜 전화해서 아무 말도 안 해”라는 핀잔도 들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둔 스마트폰은 알아서 전화를 걸곤 했다. 화면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눌려서다.
피처폰만 쓰던 최씨가 왜 이 ‘어려운’ 스마트폰을 써보고 싶어 했을까. 자식들과 더 살갑게 소통하고, 인터넷도 써보고 싶어서다. LG전자의 노인층 스마트폰 사용 실태 보고서는 최씨와 같은 노인들도 젊은이처럼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소통하길 원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처폰을 쓰는 노인이 스마트폰을 갖고 싶어하는 이유 1위가 카카오톡이다. 설문에 참여한 노인 30명 중 27명(90%)이 이같이 답했다. 스마트폰이 없으니 카톡 대화방에 낄 수조차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노인들이 스마트폰을 그저 피처폰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카카오톡 등 모바일 SNS가 아닌 단문메시지(SMS)로 문자를 주고받고, 지하철 노선도나 달력 등과 같은 기초적인 부가서비스만 주로 쓰는 것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열정은 젊은이 못잖았다”며 “하지만 자신들을 배려하는 제품이 없다는 사실에 화를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어려운 영어 메뉴와 세세한 터치 기술로 무장한 스마트폰은 노인들에게는 너무 어려운 기기였다. 카카오톡 버튼이 탑재된 폴더형 스마트폰 ‘와인 스마트’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혹시 부모님에게 구글 플레이에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방법을 설명드려 본 적이 있는가. 구글 플레이 아이콘을 누른 뒤 원하는 앱을 검색하고, 암호를 입력한 뒤 내려받으면 메뉴 폴더 안에 다운로드되고, 다시 홈 화면에 꺼내서 편하게 사용해보라고 말이다. 살면서 몇 번 써본 적 없는 이메일 주소와 대·소·특수문자 8자 이상이 조합된 암호까지 손수 입력해보라고 하면 십중팔구 ‘멘붕’이다. 자녀들도 나름 친절하게 여러 번 같은 설명을 해 주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 보는 자식은 답답하고, 쓰는 부모는 갑갑하다.
최씨도 보고서에 등장한 노인들처럼 아들과 카톡을 하고 싶어 한다. 일흔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인터넷에서 새 일거리를 찾으려 애쓴다. 터치 자판을 한 자 한 자 꾹꾹 눌러 전화번호를 찾는 등 오늘도 스마트폰에 적응 중이다.
2008년 이후 전자산업 역사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는 모바일 광풍이 21세기를 강타했다. 유수 전자업체는 치열한 스마트폰 전쟁을 펼쳤다. 누구나 좋아할 제품을 많이 팔아 높은 점유율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지상 과제였다.
스마트폰 시대의 생존 기술은 혁신이었다. 첨단 기술, 파격 디자인, 차별화 등 제조사마다 한 해 수십 가지 신제품을 쏟아냈다. 모바일 혁신 경쟁에 열광한 이들은 단연 젊은이였다. 시리, 지문 인식, 심박수 측정, NFC 등 호기심과 구매욕을 자극하는 기술이 쏟아졌다. 혁신의 상징 애플은 아이폰6, 점유율 1위 삼성전자는 갤럭시S6까지 라이벌전을 벌이고 있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방치되는 이들도 속출했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이른바 정보 소외 계층이다. 기술 주도의 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디지털 소외의 그늘은 더 짙어졌다. IT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 역시 그 발전 속도를 쫓아가기 바빴다.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는 첨단기술·제품에 더 놀랄 만한 새로움이 무언지를 찾는 게 관심사였다. 기술 발전이 가져다줄 산업적 가치를 찾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팽팽 돌아가는 세상에도 아직 아들 전화번호조차 검색하지 못하는 계층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스마트폰 2차 소외 노인’ 시리즈는 새로운 사실을 알리는 기사라기보다는 일종의 반성문이다. 등잔 밑이 어두웠다. 아니 무관심했다.
대중의 정보 소외와 디지털 격차를 염려하는 기자의 어머니도 스마트폰 위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최근 어머니에게 전화를 말로 걸 수 있는 음성 기능을 알려드렸다. 버튼을 안 눌러도 전화가 걸리자 신기하고 재밌어했다. 벌써 구닥다리처럼 느껴지는 이 기술에 어머니는 소녀처럼 해맑게 웃었다. 아들은 불효자였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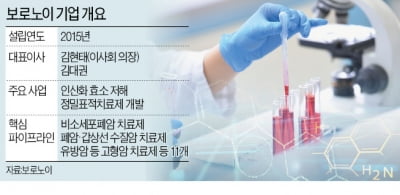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