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그들이 엿본다] 연애 시작했더니 예식장 광고가 내 폰에…'빅데이터'냐 '빅브러더'냐
휴가계획 잡자마자 여행 배너광고 빗발
구글·페이스북…정보수집 갈수록 치밀
![[SNS, 그들이 엿본다] 연애 시작했더니 예식장 광고가 내 폰에…'빅데이터'냐 '빅브러더'냐](https://img.hankyung.com/photo/201401/AA.8240227.1.jpg)
윤씨는 “휴가철도 아닌데 마음속을 읽힌 것처럼 여행 광고가 많이 보여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며 “온라인상에서의 행동 하나하나가 관찰당하는 듯해 상당히 불쾌하다”고 털어놨다.
#2. 대학원생 임현정 씨(29)의 페이스북 타임라인에는 최근 결혼정보업체 광고가 부쩍 늘었다. 친한 친구가 ‘좋아요’를 눌렀다는 예식장이나 웨딩박람회 광고도 화면 오른쪽에 자주 보인다.
임씨는 지난달 남자친구와 교제하면서 페이스북 프로필 항목인 결혼·연애 상태를 ‘싱글’에서 ‘연애 중’으로 바꿨다. 임씨는 “친구들에게 연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프로필을 수정했는데 이 같은 사적인 정보가 광고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말했다.
구글 페이스북 등 빅 데이터를 활용하는 글로벌 정보기술(IT)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광고주가 자사 플랫폼을 이용해 한층 효율적인 타깃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어디서나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접속해 지인과 연락을 주고받는 편리한 시대지만 ‘빅 브러더’의 감시는 한층 촘촘해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어떤 서비스를 공짜로 쓰고 있다면 당신은 고객이 아니라 ‘상품’이다.” 미국 인터넷 커뮤니티 ‘메타필터’ 이용자 ‘블루비틀’이 2010년 언급해 업계에서 유명해진 이 말은 이제 현실이 됐다.

지난 3일 보도된 페이스북 집단소송은 갈수록 정교해지는 빅 데이터 활용에 대한 이용자 불신이 곪아 터진 단적인 사건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미국 아칸소주의 매튜 캠벨 등은 소장에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페이스북의 수익창출 기회를 제공한다”며 “감시당하는 걸 알았다면 드러내지 않았을 정보들”이라고 주장했다.
![[SNS, 그들이 엿본다] 연애 시작했더니 예식장 광고가 내 폰에…'빅데이터'냐 '빅브러더'냐](https://img.hankyung.com/photo/201401/01.8241292.1.jpg)
플랫폼 기업은 이처럼 이용자의 자질구레한 개인정보까지 긁어와 마케팅에 이용하려 들지만 이용자는 어떤 정보가 넘어가는지조차 모른다는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구글도 지난해 G메일 이용자 10명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메일을 봤다는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그간 광고 목적의 개인정보 침해 혐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글은 지난해 11월 애플의 사파리 브라우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미국 37개 주정부로부터 17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10월 사용자가 특정 광고나 게시물을 클릭하지 않고 마우스만 올려놔도 커서의 움직임을 분석해 기록을 남기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막연한 정보제공 동의 절차
구글은 개인정보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이메일부터 위치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한다. 이용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정보 수집을 줄이는 식이다. 페이스북은 약관을 통해 이용자로부터 포괄적인 정보 제공 동의를 얻지만 실제로 어떤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한 정보보호 전문가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1년에 한 번 바퀴벌레 소독을 한다는 명목으로 집 열쇠를 달라고 요구하는 셈”이라며 “필요할 때마다 열쇠를 빌려가는 형태가 아니어서 어떤 방식으로 내 정보가 돌아다니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불만에도 구글과 페이스북은 개인정보 침해 의혹에 대해 이용자에게 동의를 얻었으며, 시스템이 체크하지 사람이 열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타깃 광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까다로운 개인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꼼수 기술’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0년 미국의 방문자 순위 50위권 웹사이트에서는 64개 추적 기술과 3180개 파일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앞으로 정보제공 동의 절차가 충분한 수준인지, 소프트웨어가 스캔(훑어보기)하는 것을 모니터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논란이 점차 거세질 전망이다.
에릭 클레먼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 교수는 “법은 기술보다 늦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스스로 정보 공개 현황을 체크해야 한다”며 “번거롭더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침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승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증기술연구팀 선임연구원은 개인화한 광고와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제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미국 일부 서비스 업체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는 것이 공정한 방식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TRI에서는 아이디 이름 전화번호 등 공개된 자료를 검색해 어떤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김보영/김태훈 기자 wi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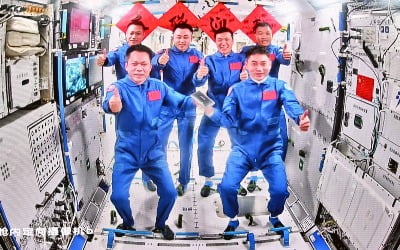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