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321만명 구인난'…실업수당 못받는 청소년 구직만 급증
실제 채용은 608만명에 그쳐
청소년 실업률 70년만에 '최저'

하지만 채용된 인력은 608만 명에 그쳤다. 기업 등이 공고를 내고도 일할 사람 321만 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구인공고와 채용 인력 간 격차는 2월 174만 명에서 두 달 만에 거의 두 배로 뛰었다. 미 상공회의소가 지난주 회원사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5%가 “인력 수급 문제로 기업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실업률이 4월 기준 6.1%로 비교적 높은데도 구인난이 심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새 직업을 찾지 않는 실직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기존 실업수당 외에 주당 300달러씩 더 지급하는 ‘코로나19 추가 실업급여’가 주요 배경 중 하나란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집에서 놀면서 챙기는 실업수당이 호텔 식당 공장 등에서 일할 때 받는 돈보다 더 많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다. 이에 따라 앨라배마 오하이오 등 10여 개 주정부는 “퍼주기식 실업수당이 인력 수급 불일치를 야기하고 있다”며 이달부터 추가 급여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고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임금 인상은 물론 자녀 학자금까지 지원하기 시작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에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대주는 건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폐기물 관리업체 웨이스트매니지먼트의 짐 피시 최고경영자(CEO)는 “한 명을 새로 뽑는 비용이 1만2000달러에 달할 뿐만 아니라 직원 교육 비용은 훨씬 더 든다”며 “안전 사고의 절반이 입사한 지 3년 미만 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인력이 떠나지 않도록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적인 구인난 속에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는 청소년의 구직률은 치솟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신규 고용된 근로자의 약 40%는 16~19세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소년 실업률은 1953년 이후 가장 낮다. 이들은 대부분 저숙련 임시직이어서 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용 수요와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고 WSJ는 지적했다.
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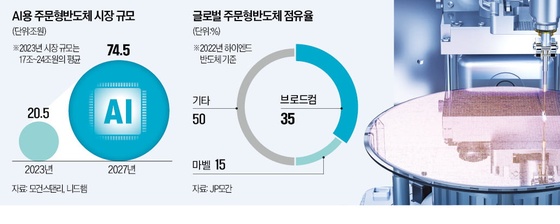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