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소비자에 원가부담 전가
오레오 용량 줄여놓고 "신제품"
펠로톤, 실내자전거 설치비 요구
디즈니는 놀이기구 예약 유료화
무료 버스 없애고 설치비 청구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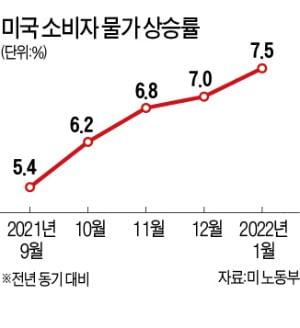
홈트레이닝 업체 펠로톤은 지난달부터 실내자전거의 배송·설치비로 250달러를 청구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펠로톤은 실내자전거 가격을 1895달러에서 1495달러로 내려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지만 이번에 추가된 설치비를 합치면 1745달러로 기존 가격과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오토바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도 원자재 할증료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부과가 기본가격을 올리는 것보다 가격 조정을 하기 더 수월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세계적 반도체 공급난으로 차량 공급이 줄고 가격이 치솟자 자동차 업계는 값비싼 옵션을 끼워 팔기도 한다. 자동차 구매 컨설팅업체 오토매치컨설팅의 톰 맥파랜드 설립자는 “대리점에서 신차를 팔 때 머드플랩(흙받이)이나 트렁크 보호매트 등을 끼워 파는 게 업계의 관행이 됐다”며 “결국 최종 가격이 판매가격보다 수천달러를 웃도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의 반발에 더 정교해지는 기업들

이에 따라 기업이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방식이 더 정교해지고 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원가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점점 소비자들이 이런 방식을 알아채자 기업들이 제품의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맛이나 포장을 바꿔 신제품 형태로 내놓기도 한다고 WSJ는 전했다. 지난달 제과업체 몬델리즈인터내셔널은 제품 가격을 평균 6~7% 인상한 데 이어 자사의 인기 제품 오레오의 크기를 줄이고 맛을 바꾼 신제품을 출시했다.
숙박업계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가격은 그대로 둔 채 무료 조식을 없애고 객실 청소 횟수를 축소하는 식이다. 무료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편의시설 운영을 중단하기도 한다. 조너선 처치 미국 노동통계국 이코노미스트는 “숙박업소가 하루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방을 청소해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그 베이커 식품산업협회(FMI) 부회장은 “소비자들이 (실질적 가격 인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고민 없이 쇼핑하게끔 하기 위한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비용 전가 방안을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단독] 與, '한동훈 사살설' 김어준에 법적대응 나선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N.38932878.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