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돌풍에 여행 필수앱이 된 '그랩'

동남아시아는 나라마다 교통수단이 참 다양하다. 택시, 철도, 수상 보트, 버스, 오토바이를 개조한 툭툭 등 가는 곳마다 차이가 있다. 싱가포르나 태국 방콕을 여행해봤다면 ‘MRT(Mass Rapid Transit)’라 부르는 전철의 쾌적함에 놀랐겠지만, 오토바이 소음에 어디로 가야할지 멘붕(?)의 추억을 선물하는 곳도 많다. 경제적 수준에 따라 나라마다, 한 나라 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적 특성을 확인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캄보디아는 동남아 중 교통이 가장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수도 프놈펜에서조차 그 흔한 택시는 찾을 수 없다. 사람들이 잘 타지 않는 버스는 간혹 보이는 정도다. 신기하게 '툭툭'이 오랫동안 왕좌를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프놈펜에 발을 들인지가 8년이 넘었는데 크게 다르지 않다.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이 올라와서 도로를 정비하고, 전철 사업 계획이 있을 만한데, 관련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툭툭을 운전하고, 사업체를 가진 집단이 영향력이 있어 변화가 쉽지 않다는 말도 들리는데 자세한 내막은 알기 어렵다.
필자가 캄보디아 생활을 하던 초기에는 여기저기 이동할 일이 많아 툭툭은 너무나 고마운 존재였다. 열악한 프놈펜의 교통 여건 속에서 툭툭이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다른 나라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관리하고, 운전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툭툭은 열기가 후끈한 프놈펜의 편리한 이동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툭툭의 이용 요금이다. 택시처럼 미터기가 있거나 버스처럼 사전에 고지된 고정 요금이 아니라 같은 구간인데도 탈 때마다 지불하는 요금이 다르다. 기사가 갑이다. 툭툭을 운전하는 기사들 마음대로 요금을 부른다는 말이다.
초기에 툭툭을 이용할 때는 툭툭 기사와 말도 잘 안 통하고, 현지 생활이 익숙하지 않으니 기사가 달라는 대로 요금을 지불했다.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좋지 않았다. 바가지를 쓴 기분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이 쌓이다 보니 요령이 생겼다. 툭툭을 타기 전 미리 흥정을 하게 됐다. 늘 가던 곳은 대충 요금에 대한 감이 생기니 과하게 돈을 내는 잘못을 줄이게 된다. 지금까지 적정 요금 이상의 돈을 쓴 걸 생각하면 머리를 쥐어뜯고 싶지만, 이것도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위안을 해본다.
머리가 다 뜯겨 나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 구세주가 등장했다. 이제는 우울한 흥정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으로 거리와 시간에 따라 정확한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뜨거운 땡볕을 맞으며 지나가는 툭툭을 애타게 손짓할 필요도 없고, 요금이 많다, 적다 실랑이할 필요도 없어졌다. 팁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해방이다. 스마트폰만 들고 나가면 툭툭 기사와 한마디 말도 필요 없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놀랍게도 ‘우버(Uber)’처럼 차량을 소유한 개인이 앱에 등록하여 영업하는 차량 공유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툭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에어컨의 시원함을 누리면서. 캄보디아에서도 동남아 여행자들의 필수 앱이 돼버린 ‘그랩(Grab)’이 대표 선수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물결이 이곳 캄보디아까지 덮치고 있다. 전 세계 디지털 전환의 기세가 캄보디아에서도 돌풍을 일으키며 모바일 결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캄보디아 사정을 잘 모르고, 선입견을 품은 사람이라면 사회 시스템이 많이 뒤처진 나라에서 디지털, 모바일 결제와 같은 혁신이 가능할지 당연하게 의문을 갖게 된다. ‘폰은 잘 터져?’라고 묻는 사람도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캄보디아로 취업이 결정됐다면 이제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된다.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금융서비스가 캄보디아 생활의 많은 불편함을 날려주고 있다. 툭툭 뿐만이 아니라 배달앱 ‘얌24’, ‘이겟(E-get)’으로 숙소에서 편안하게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다. 장소와 사람만 다를 뿐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때도 많다. 해외 취업자 신분으로 살면서 디지털 혁신이 앞으로 캄보디아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지켜보는 것도 꽤나 흥미롭다. 취업자에서 창업자로 신분이 바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최주희 피플앤잡스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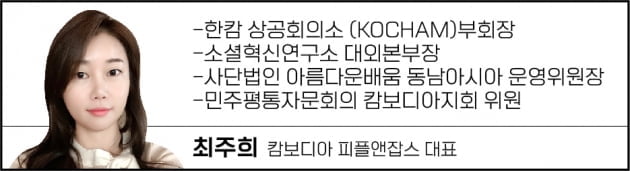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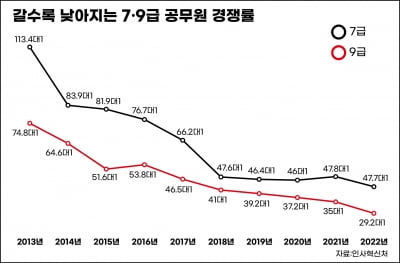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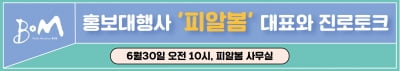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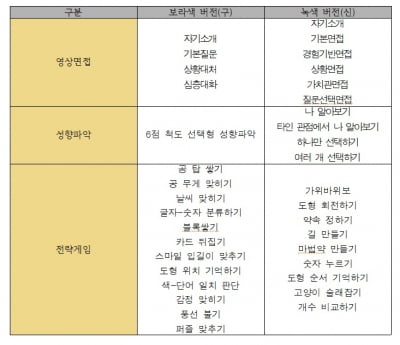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