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20억' 강남 아파트, 팔린 가격이…업계도 놀랐다
작년 4분기 수도권 공시가 이해 매매 303건
동년 평균치 대비 6배 ↑
공시가보다 2.4억 낮은 거래도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4분기에 수도권에서 303건이 단지 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 이하로 거래됐다. 같은 해 1분기(45건)의 14배가 넘는 수치다.
증여 등의 이유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 중 232건이 공시가 이하로 손바뀜했다.
개별 단지의 낙폭은 더 크다. 서울 서초구 ‘서희융창아파트’ 전용 101㎡는 지난달 9억3480만원에 거래됐다. 단지 내 동일면적 최저 공시가(11억8000만원)보다 2억4520만원 낮은 금액이다.
강남구 ‘개포주공6단지’ 전용 83㎡는 지난달 중개를 통해 최저 공시가인 20억800만원보다 약 1억원 낮은 19억원에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는 작년 11월 최저 공시가(7억200만원)보다 7200만원 낮은 6억3000만원에 손바뀜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가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져 과도한 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통 각종 주거 지원 대출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실제 거래액보다 공시가가 높은 경우 대출 또는 보증액이 올라가 깡통 전세나 부실 채권을 야기할 수 있다”며 “공시가는 보유세의 산정 근거로 활용돼 실제 자산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을 경우 실수요자의 세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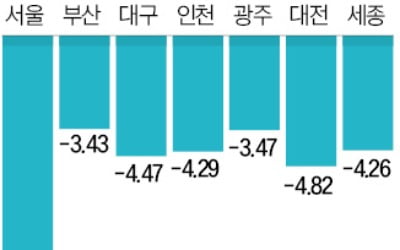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