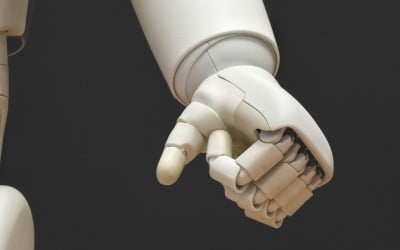尹 "美도 법조인 정관계 진출…그게 법치국가"
좁은 인재풀 지적하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野 "검찰공화국 현실화"
금감원장도 檢출신 지명엔
"감독·규제 전문가로 적임자"
금융권 일각 '사정 태풍' 우려
MB 사면 가능성엔 '신중론'
이틀 연속 “이복현은 적임자”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감원장에 검사 출신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가 뭔가’라는 질문에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 기관으로,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갖고 예측 가능하게 일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 집행을 해본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늘 생각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원장은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했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과정에서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다”며 “금융 감독 규제나 시장조사에 대한 전문가로 아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대통령실은 금감원 개혁도 명분으로 내세웠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장에 학계와 관료 출신들이 주로 임명됐지만 금감원의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금융업계에 많이 있었다”며 “(윤 대통령이 금감원의 역할과 기능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정·관·재계에서 제기되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민들의 검찰 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며 날을 세웠다.
금융권 “기대 반, 우려 반”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 금융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우선 금감원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감원 설립 후 24년간 임명된 15명의 금감원장 중 행정고시 출신 경제 관료가 11명에 이른다. 자본시장에서 금감원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회장직에 업계, 학계, 감독당국 출신들이 골고루 임명되는 것과 대조적이다.이는 금감원이 피감 대상 위에 군림하며 각종 위기 대처에 실패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2000년 초 카드 대란을 시작으로 2010년 초 저축은행 사태, 문재인 정부의 사모펀드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국내 시중은행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간회사 경험이 없는 모피아(옛 재무부+마피아 합성어)와 감피아(감독원+마피아 합성어) 출신들이 줄줄이 피감 금융회사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관행이 퍼지면서 감독과 검사 기능이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에서는 금융회사 경험이 없는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과연 제대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특히 “검사 등 법조인 출신들이 정·관계에 폭넓게 진출한다”는 대통령 발언에 대해 반박하는 목소리가 컸다. 미국에서도 법조인이 정부 고위직에 기용되려면 관련 민간 분야에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스타 검사 출신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SEC 위원장을 지난 메리 조 화이트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위원장으로 임명되기 전 10년 동안 인수합병(M&A) 전문 민간 법률회사에서 10년간 일했다.
정치적인 이유로 금융사에 대한 사정에 나서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특히 올해와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신한금융, KB금융, BNK금융 등 대형 금융사들이 대통령실과 금융당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사 대표는 “특수통 검사들이 법을 잘못 적용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얼마나 많았냐”며 “정치 상황에 휘둘려 칼을 휘두르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좌동욱/빈난새 기자 leftking@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