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코너] 韓ㆍ日 또다른 차이
사고는 오키나와 후텐마비행장 인근의 오키나와국제대학에서 발생했다.
헬기가 캠퍼스 안에 떨어져 교실 건물이 부서졌고,3백m 떨어진 민가까지 파편이 날아가 피해를 냈다.
학생들 부상은 없었고,조종사 3명만 중경상을 입었다.
미군측은 추락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봉쇄,사태가 악화됐다.
일본경찰이 사고조사를 위해 출동했으나,미군측은 현장을 봉쇄하고 민간인은 물론 경찰의 출입도 금지시켰다.
시당국은 항의했지만 미군측은 1960년 체결된 미·일지위협정을 들이댔다.
미·일지위협정에 따르면 미군에게 사고가 났을 경우 미군이 요청을 해야 현지 경찰이 조사할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미군측은 사고 경위가 밝혀질 때까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공 훈련을 중단해 달라는 현지인들의 요구를 무시,사고 3일 뒤부터 비행훈련을 재개했다.
현지 주민들의 시위는 이어지고 있지만 미군측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오키나와 지사와 시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미군측을 성토하고,도쿄에 올라와 미국대사관과 외무성 방위청 등을 방문해 사태 해결을 시도했다.
그러나 오키나와 주민의 요청은 중앙정부나 언론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일부 언론만 후속 기사를 다루고 있고,대부분 방송이나 중앙 일간지는 사태를 축소 보도하고 있다.
오키나와 지사가 사태해결을 위해 총리와의 면담을 요구하자,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여름휴가를 '핑계'로 만나주지 않는 등 정치권도 사태 확대를 경계하고 있다.
뾰족한 해결 방안도 없는데,미·일 관계만 꼬일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은 아직도 피점령국'이라는 자괴적인 기사를 실었지만,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야기된 뼈아픈 현실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한국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광화문 등 전국 거리는 반미 시위대로 넘쳐났을 것이다.
가치 평가를 떠나 한국과 일본이 다른 또하나의 측면이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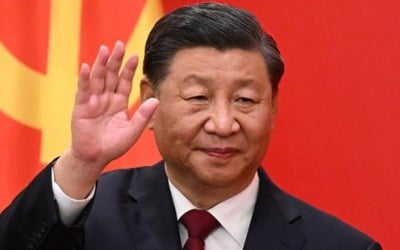




![3대지수 실적시즌 기대에 상승…테슬라 15%대 급등 [뉴욕증시 브리핑]](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6673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