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호수공원 만들어 준다더니…" 터질 게 터졌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사비 갈등에 고급화 눈치싸움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조합원 분양 일정을 시작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단지에서는 “당초 약속했던 마감재가 쓰이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합원 분양을 위해 만든 견본주택의 품질이 시공사 선정 당시 사양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한 조합원은 “시공사 선정 당시 단지 내 조성하기로 했던 특화 호수공원 대신 물놀이터가 생겼고, 내부 마감재도 품질이 더 낮은 제품으로 전시됐다”며 “공사비는 증액했는데 사양은 다른 단지만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합과 시공사는 “공사비 증액 과정에서 추가 사양 고급화가 합의됐고, 내역을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사정은 다른 현장도 마찬가지다. 서초구의 또 다른 고급 오피스텔은 해외 마감재 대신 국산 마감재가 사용됐다는 이유로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동작구의 한 재건축 조합 역시 커뮤니티에 사용된 마감재가 약속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주 후에도 주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단지 고급화 설계와 고가 마감재 사용을 두고 현장마다 갈등이 잇따르는 것은 최근 공사비 상승 폭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다수 현장이 공사비 증액 조건으로 추가 고급화를 내걸었다. 하지만 조합원의 기대와 시공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갈등을 막겠다며 지난 1월 ‘정비사업 표준계약서’를 배포했다. 시공사 선정 전에 마감재와 설계 등을 모두 확정해 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사업 기간이 길어 자재 수급 상황이 변화하는 데다 공사 중간에도 마감재 사양을 변경하는 사례가 흔하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표준계약서 내용은 좋지만, 현장에 적용하기엔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사전에 다 확정해야 하는 구조”라며 “표준계약서 채택률을 높이려면 사양 변경 등에 대한 기준이 탄력적이고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오상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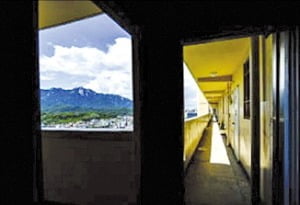


![K팝 업계에도 '친환경' 바람…폐기물 되는 앨범은 '골칫거리' [연계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2206/99.2746427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