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에서 터져 나온 기침 소리…"계속해" 피아니스트는 되뇌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은아의 머글과 덕후사이
클래식 덕후를 위한 북리스트
클래식 덕후를 위한 북리스트

30대 평범한 직장인·클래식 애호가
조율의 시간
이종열

최근 아연실색한 음색과 ‘넘사벽’의 프레이징으로 레전드 내한 연주를 선보인 피아니스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은 본인의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뿐만 아니라 조율용 장비도 늘 휴대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 연주자마다 악기마다 발현되는 차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비롯되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많았는데 <조율의 시간>을 읽고 꽤 많은 지식을 얻었다.
대한민국 피아노 조율 명장 1호인 작가는 이 책에서 건반의 무게, 페달의 높이, 홀의 음향 상태에 따른 보이싱 등 피아노 조율의 실제를 다루지만 머글로서 더욱 재미있는 부분은 세계 유수 연주자들과 악기를 조율하며 경험한 에피소드다.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자가 있다면 그 연주자의 음색과 주법을 떠올리며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보여줘요
알렉상드르 타로 지음, 백선희 옮김

개인적으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유명한 홀과 음악 축제에 대한 타로의 견해였다. 객석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대한 피아니스트의 심경도 재미있다. 그의 기준에서 최고의 홀은 보스턴 심포니홀이고 함께 연주하고 싶은(?) 지휘자는 야니크 네제 세갱이다. 좋은 홀에선 객석의 박수 소리로 관객의 만족도를 가늠할 수 있고, 연주 중 기침 소리, 가래 소리, 속삭임까지 연주자에게 전부 전달돼 연주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피아노를 듣는 시간
알프레드 브렌델 지음, 홍은정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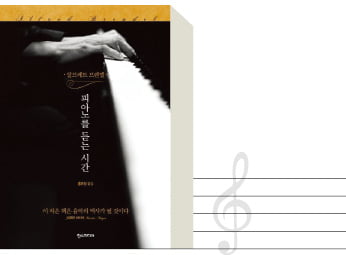
어떤 태도로 음악을 대해야 하는지, 각 작곡가가 악보에 지시한 여러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음악에 반영해야 할지에 대해 따뜻한 어투로 조언한다. 슈베르트와 슈만의 대가로 널리 알려져 있는 만큼 이 두 작곡가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는다. 단순함, 고요, 피아노 협주곡, 그랜드 피아노 등 여러 키워드를 주제로 간결하게 할아버지의 지혜를 설파한다. 읽는 순간 곧바로 브렌델의 음악처럼 고요하면서도 명료한 정서가 만들어진다.
오래되고 멋진 클래식 레코드
무라카미 하루키 지음, 홍은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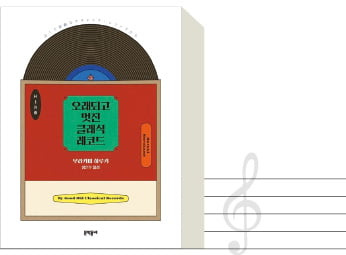
더욱 놀라운 점은 그의 광활한 감상 커버리지다. 버르토크와 플랑크의 교향곡은 물론이고 돈 후안, 카르미나 부라나 등의 오페라, 바이올린 소나타, 피아노 소나타와 피아노 5중주, 현악 4중주 등 실내악까지 세상의 모든 클래식 음악을 섭렵했다. 각 레코딩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명하게 짚어나가면서 호불호 요소를 정리한다. 덕후가 아니더라도 쉽게 읽을 수 있다.
크로이체르 소나타
레프 톨스토이 지음, 이기주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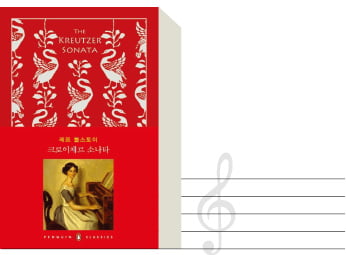
‘크로이처 세계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체코의 작곡가 레오시 야나체크는 톨스토이의 소설 <크로이체르 소나타>에서 영감을 받아 ‘크로이처’라는 이름의 현악 4중주를 작곡했다. 음험하면서도 익살맞고 때로는 처절한 멜로디와 다이내믹함이 제법 소설과 닮았다. 원작인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와 그를 잇는 톨스토이의 중단편 소설, 이어 세계관 완성본인 야나체크의 현악 4중주를 번갈아 감상하면서 예술가들에게 상상력이란 무엇인지, 그 불꽃은 어떻게 타오르게 되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좋은 감상이 된다.



![[방송안내] <클래식 온에어> 수원시립교향악단 제289회 정기연주회 - 합창(Choral)](https://img.hankyung.com/photo/202401/01.3558137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