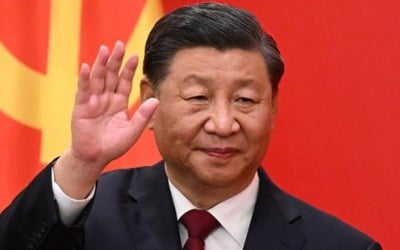[특파원 시선] 타오르는 지구…'기후변화' 속 편한 소리 아니었다
![[특파원 시선] 타오르는 지구…'기후변화' 속 편한 소리 아니었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307/PRU20230714096101009_P4.jpg)
어디나 현실은 냉정하고 이방인에게는 한층 더욱 그렇다.
복잡한 기저에 깔린 인종 차별과 같은 골치 아픈 문제까지 넘어가지 않더라도 문화적 차이는 항상 타자에게 더 가차 없다.
속된 말로 '텃세'다.
위축된 타자 본인이 한층 크게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모국어가 아닌 말을 사용하는 답답함도 항시 그늘과 같이 따라다닌다.
미묘한 언어의 섬세한 엇갈림을 좀처럼 표현할 수 없을 때, 식당에서 밥을 사먹고 길을 물을 수 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절감하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2년이 다 돼가는 미국 생활에서 좋은 점을 꼽자면 공기와 기후라고 할 수 있다.
아니 있었다.
서울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미세먼지 짙은 답답한 회색 하늘과 달리 워싱턴DC의 공기는 항상 '양호' 수준의 오염 농도를 유지해온 게 사실이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 중 하나는 귀국길에 미국 생활은 하나도 생각날 것 같지 않지만, 워싱턴의 공기만은 그리울 것이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런 워싱턴의 공기가 올여름에는 서울보다 더 혼탁했다.
몇 주간 이어진 캐나다 산불의 여파로 수주간 워싱턴을 비롯해 미국 전역의 대기질 지수(AQI)가 '나쁨'(unhealthy) 상태를 이어간 탓이다.
통상 한국보다 시원하다고 느꼈던 기온도 크게 올랐다.
습도 또한 마찬가지다.
이곳에서는 그늘에 들어가면 여름에도 시원하다는 말은 정말 옛말이 돼 버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줄곧 핵심 의제로 '기후 변화'를 강조해 왔다.
모든 방면에서 등을 돌리다시피 한 중국과 만날 때마다 '기후 변화'를 둘러싼 공조만은 빼놓지 않고 당부할 정도로 말이다.
초고속으로 진행된 압축 근대화의 끄트머리를 살아온 본인으로서는 솔직히 누릴 만큼 누린 자의 속 편한 소리라는 꼬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미국을 비롯한 제1세계가 주도한 산업화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자, 결실을 누린 그들은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외치지만 정작 아직도 피폐한 제3세계는 개발의 혜택조차 누리지 못한 채 제약만을 나눠서 져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측면에서다.
그럼에도 이 여름을 지나며, 물속을 부유하는 것 같은 습도와 작열하는 태양, 폭우가 내리는 한국의 안부를 걱정하는 요즈음 기후변화는 결국 인류가 나눠서 져야 하는 짐이 돼 버렸다는 생각이 든다.
원인이 어디에 있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덮쳐오는 이때 더 늦기 전에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너무도 자명한 명제다.
다만 적어도 이 문제만큼은 힘의 논리가 아닌 끈기 있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법을 도출하기를 바란다.
'지속가능성'이란 그런 것이니까.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G7, 2035년부터 석탄발전 중단…에너지 27% 의존 日 '초비상' [원자재 포커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56853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