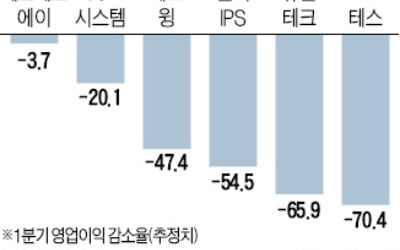인권경영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담은 국제연합의 ‘글로벌 콤팩트 보고서’와 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등은 인권경영을 기업의 국제적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500인 이상 기업에 인권, 환경 등 비(非)재무적 성과 공시를 의무화했다. 인권경영이 이제 ‘지속가능한 경영’의 필수 조건이 된 셈이다.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 인권경영이 국내 기업들에 급속히 확산돼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과 제품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걸맞은 품격과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권경영 못지않게 ‘경영인권’ 보호도 시급하다. 기업들이 경영환경 악화로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반(反)기업 정서가 팽배하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기업과 경제 성장이 저해돼, 결국 근로자 복지와 인권 향상도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인들은 유성기업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노조의 무차별 폭력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경영판단까지 검찰의 ‘걸면 걸린다’는 배임죄 남용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2주 만에 형사처벌 수위를 크게 높인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투자와 일자리 근원인 기업이 생존 위기에 처한다면 기업의 보호를 받아야 할 근로자들도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기업에 인권경영과 경영인권은 하늘을 나는 새의 양 날개가 돼야 한다. 기업과 기업인이 존중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인권경영도 제대로 날개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