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한국 속의 터키
![[천자 칼럼] 한국 속의 터키](https://img.hankyung.com/photo/201709/AA.14646497.1.jpg)
6·25 때 참전한 터키군은 약 1만5000명. 이들이 치른 대규모 전투만 14차례에 이른다. 1951년 경기 용인 김량장동 151고지 전투에선 가장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다. 중공군 전사자가 1900여 명이었으나 터키군 전사자는 12명에 불과했다. 이를 기념하는 비석이 용인 동백동에 있다. 용인시는 2005년 터키 카이세리시와 자매결연을 하고 참전용사 15명을 초청해 그날을 기리기도 했다.
터키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른다. 과거 돌궐 시절부터 ‘튀르크(터키인)’와 고구려가 친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6·25전쟁의 인연이 더 직접적이라고 한다. 우리가 용인에 참전비를 세운 것보다 1년 먼저 수도 앙카라에 참전비를 세운 것도 이 때문이다. 연평도 피격 때 “한국은 혼자가 아니다. 1950년대 내 할아버지가 한국을 위해 싸웠고 나도 그럴 것이다”는 글을 올린 젊은이도 있다.
서울 이태원에는 국내 최초의 이슬람 모스크가 있다. 이슬람교는 터키군의 신앙 생활을 돕기 위해 파견된 두 명의 성직자를 계기로 우리나라에 전파됐다. 1976년 정부가 터키군의 참전에 보은하는 뜻에서 시유지를 제공해 사원을 짓게 했다. 이곳 주변이 할랄 식당 등 이슬람 문화의 중심이 된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한국에 대한 터키인의 호감은 2002년 월드컵 때 더 커졌다. 한국과 3·4위전을 벌일 때 한국 관중이 터키 국기를 흔들며 응원하자 터키 전역이 열광했다. 경기에서 진 한국 선수들이 터키 선수들의 등을 두들겨주는 훈훈한 모습에 감격하기도 했다. 터키인들은 관광지에서 만난 동양인에게 일본어보다 한국어로 먼저 인사한다. 2013년 경주-이스탄불 엑스포 개최 뒤에는 양국 우호기념비를 서로 설치했다.
서울 여의도에는 앙카라공원이 있다. 앙카라에도 한국공원이 있다. 양국은 올해를 ‘한·터키 문화교류의 해’로 정하고 서울과 앙카라, 이스탄불에서 축하 행사를 잇달아 열고 있다. 어제는 여의도 앙카라공원에서 한·터키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터키의 날’ 행사도 열었다. 함께 손잡고 춤추는 양국 젊은이들 모습이 영락없는 형제다.
고두현 논설위원 kdh@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한경에세이] 꼬인 문제를 푸는 전략 노하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36609646.3.jpg)

![[토요칼럼] 염증 같은 나라!…플라톤의 저주 피하려면](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7.14342445.3.jpg)


![엔비디아 이을 "숨은 AI 수혜주"…월가 47% 더 오를 것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B2024052507272374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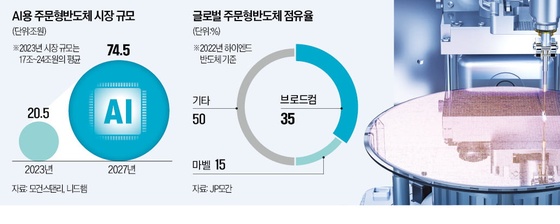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